글 문이영
입추는 옛날에 지났고 백로가 닷새 전이었으므로 사실 여름은 오래전에 끝났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뉘엿뉘엿한 해를 보다가 맥없이 가버린 여름이 불현듯 아쉬워 쌀 한 컵에 보리 반 컵을 씻어서 불려 놓고 바깥으로 나왔다.
겪어본 중 손에 꼽게 맹숭맹숭한 여름이었다. 연일 퍼붓던 비가 그치고 뒤늦게 찾아온 무더위도 잠시, 쌀쌀한 새벽 공기에 자다 일어나 창을 닫았던 것이 이미 보름 전 일이다.
여름은 떠났으나 들녘에는 축축한 여름 냄새가 남아 있다. 태양이 황도를 따라 멀어진 거리만큼, 서늘해진 땅 위에서 여름의 냄새가 천천히 썩고, 썩으면서 짙어지고 동시에 말라간다.
나무와 수풀 사이를 걸으며 온갖 자라는 것들을 본다. 옥수수가 그사이 여물었고 콩깍지는 튼실해졌다. 다들 열심히 자라고 있었구나, 햇빛과 비와 바람을 맞으며 자라고 있었구나. 내 생활은 안온하고 협소했는데, 다들 저마다 무언가를 이겨내고 있었구나. 바깥을 걷다 보면 알게 된다. 나는 너무 많이 불평했다.
낮에 있었던 일이다.
장을 보러 갔는데 처음 보는 아저씨가 햇밤을 팔고 있었다. ‘한 바구니에 오천 원’ 굵은 펜으로 힘주어 눌러 쓴 글씨 뒤로 바구니 가득 담긴 밤을 보면서 밤이 나오다니, 정말 가을이구나, 생각했다. 잘 손질된, 큰 마트에서 보던 매끈한 밤이 아니라 가시가 잔뜩 달린 옷을 입고 나온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어떤 밤송이는 푸른 빛이 더 많이 돌았다. 오복히 쌓인 밤송이 사이로, 함께 딸려 들어온 모양인지 밤나무의 것으로 짐작되는 이파리도 간혹 보였다.
내 앞에 놓인 밤들이 너무나 생생해서 나는 밤이 태어나 자란 곳을 쉬이 상상할 수 있었다. 그곳은 새벽안개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가을 산. 다저녁에 이슬로 풀숲이 젖는 가을 산. 밤송이 아람 벌어지는 소리 무시로 울리는 가을 산. 그곳에 밤나무가 있다. 푹신한 낙엽 위로 밤송이를 떨어트리는 밤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무리 지어 살아가고 있는 밤나무들을 상상하다가 그만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것은 아저씨의 목청 때문이었다. 살 것 같은 모양새를 하고 파라솔 아래를 기웃거리자 안 그래도 우렁찬 아저씨 목소리에 갈수록 활기가 돌았다. “여기 다 오천 원! 마음에 드는 걸로 가져가요.”
그렇게 밤을 사 온 것이다. 푸르스름한 가시를 보다가, 이파리의 출처를 궁금해하다가, 그것이 살았을 곳을 상상하다가. 얼떨결에, 그러니까 실수로. 아저씨의 목청 때문에 혹은 가시 사이로 빼꼼 보이던 송이 밤이 눈에 밟혀서. 에라 모르겠다, 계획에 없던 밤을 바구니째 사고 말았다.
밤이라는 것이 원래 집에 들이면 계속 생각이 나게 마련인 건지, 밤을 처음 사본 나는 틈만 나면 밤을 생각했다. 글을 쓰다가도 냉장고 문을 열다가도 문득문득 떠올라서 공연히 베란다에 나가 밤송이들이 잘 있나 확인했다. 나간 김에 창가에 붙어 서서 바람을 맞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러는 동안 가을을 곱씹었다. 내가 밤을 생각할 때마다 가을도 좇아와서 내 곁을 기웃거렸다. 실수로 산 밤 한 바구니 때문에 나는 온종일 밤과 가을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사람이 된 것이 기뻤다. 어처구니없게도 잘 살고 있다는 기분마저 들었다.

Forêt de Compiègne, Berthe Morisot [출처]
비슷한 일화를 알고 있다.
어쩌다 산 밤을 온종일 생각하듯, 오 년 전 어쩌다 알게 된 이야기를 여태 기억하고 있다. 실수가 카페 이름이 된 이야기다.
지상에서 세 발자국 밑으로 내려가 커다란 문을 밀면 들어갈 수 있었던 카페의 이름은 ‘카바레 마키아토’. 카라멜* 마키아토를 ‘카바레’ 마키아토로 발음하고 만 친구의 말실수를 카페 이름으로 해버렸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멋진지. 환승역이 가까우니까, 주변에 식당이 많으니까. 갖은 이유를 들어 그곳에서 약속을 잡은 후 카페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일은 나의 오롯한 기쁨이었다.
카바레는 아니지만 어쨌든 카바레이기도 하니까, 그런 이유로 간판 주위에 알전구를 달고 입구에 미러볼을 설치한 카페여서 좋았다. 무대도 무희도 없이 홀로 돌아가는 미러볼 앞에서 생캐러멜이 잔뜩 올라간 카바레, 아니 카라멜 마키아토를 여러 잔 마시며 어느 해의 여름을 보냈다.
여름다운 여름이었다. 주로 바깥에 머물렀고 대체로 걸어 다녔다. 발등이 새카맣게 타도록 걸어 다니던 동네가 생각난다. 교회와 옷가게, 병원과 꽃집, 미용실과 삼겹살집- 평범하고 이질적인 상점들이 차례로 이어지는 번잡한 대로가 특징인 동네였다. 그러나 사거리를 두 번 지나 과일과 생선과 휴지 따위를 함께 파는 슈퍼를 보면서 오른편으로 꺾어 들어오면 전혀 다른 길도 있었다.
잎사귀들이 만드는 그림자와 어룽어룽하는 빛이, 걷는 동안 이마와 눈두덩을 쓰다듬고 등허리를 따라 툭 떨어지는 곳. 오래된 벽돌 빌라들이 오래된 나무들과 함께 늙어가는 한적한 길을 걸으며, 여름의 생리가 그러하듯 쉬지 않고 자라느라 고단한 마음을 녹이곤 했다. 매미가 일순간 울음을 그칠 적마다 뒤를 돌아보고, 조용히 흔들리는 여름의 빛과 어둠을 보는 일이 그해 여름 내내 반복됐다.
카바레 마키아토는 그 길을 도로 빠져나와 번잡한 대로를 건너면 이십 분을 걸어 도착하는 거리에 있었다. 여름다운 여름이었으나 가을마다 생각나는 이유는 지금은 없어진 곳이어서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많은데 정작 그것들이 곁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계절. 가을에는 없는 것들에 대한 마음으로 깊어진다. 마냥 없기만 한 것은 아니다. 썩으면서 사라지고 사라지면서 짙어지는 여름의 잔향처럼, 텅 비어가는 가운데 짙어지는 것도 있음을 가을로부터 배운다.
그런가 하면 졸아들면서 깊어지는 맛은 어쩌다 맛본 무화과 케이크가 가르쳐주었다. 작고 둥근 접시에 담겨 나온 무화과 케이크를 한 입, 키가 작고 널따란 찻잔에 담긴 뜨거운 밀크티를 한 모금. 번갈아 먹으며 속을 데우던 가을밤, 뭉근하게 졸인 무화과를 씹으며 생각했다. 밤 맛이 나네. 그 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고 다녔다. 혹시 알고 계세요? 졸인 무화과에서는 밤 맛이 난답니다.
대화 중에 무화과가 등장하면 꼭 그 이야기를 했다. 그때마다 어처구니없게도 약간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
조그맣고 낡은 나무 의자에 웅크리듯 앉으면 좁다란 서교동 비탈길과 가로수가 보이던 이곳 카페 역시 삼 년쯤 전에 사라졌다. 사진을 찍어둘 걸, 넋두리는 매해 가을 반복된다.
그러니까 삼 년 정도 되었다. 넋두리도 밤 맛 나는 무화과 이야기도 말이다. 실수로 산 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무화과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기회가 생겨서 나는 기쁘다.

Blue and Orange Sky, Paul Huet [출처]
아무도 해치지 않는 이야기를 많이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밤 맛 나는 무화과 조림이 그런 글이 될 수 있을까.
아무도 해치지 않는 실수를 하고 싶다. 그런 실수라면 되도록 많이 하고 싶다. 그런 실수를 잔뜩 한 후 실수에 관한 글을 쓰고 싶다. 실수로 산 밤송이 한 바구니가 그런 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사실은 뭔가를 흉내 낸 것인지도 모른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니까. 아저씨의 호객 행위와, 밤송이의 색깔과, 딸려 온 이파리에 기대어 뭔가가 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잘 사는 사람 혹은 더 나은 사람. 가벼운데 짙은 사람 혹은 무해한 농담을 하는 사람.
그리하여 바야흐로 가을이다.
가을을 좋아한다. 가을, 하고 말하려다 들이마시게 되는 스산한 냄새. 을, 하느라 혀가 입천장에 가벼이 붙었다 떨어지는 것. 을, 하고도 남아 있는 여운. 모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다. 무엇보다 마르면서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서 짙어지는 만물을 보는 일이 사뭇 기쁘다.
들녘 위로 한 차례 더 낮게 꺾이는 햇살을 느끼며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돌아서서 보았다. 내 키만 한 옥수수밭 사이로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것. 저기 숲 왼편 허리를 돌아 나가는 것. 돌아 나가며 사라졌다가, 더 작아진 모습으로 나타나 멀리 언덕을 넘어가는 것. 여름의 뒷모습이라 생각되는 것을 오래 바라보는 동안 바람이 멎었다. 소란하던 새들이 조용해졌다. 숲 그림자가 길어졌다.
길어진 그림자를 달고 들어와 밥을 안치고 저녁을 차렸다. 어둠을 몰아내고 싶지 않아서, 어둠 속에서 작고 노란 스탠드를 켜고, 보랏빛이 한 줌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질 때까지, 일몰 속에서 천천히 밥을 먹었다. 여름의 마지막 빛을 꼭꼭 씹어 먹었다.
──────────


‘우울이라 쓰지 않고’는 [월간소묘 : 레터]에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연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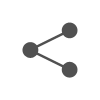
![[우울이라 쓰지 않고] 유월이 하는 일](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0/05/thong-vo-Maf7wdHCmvo-unsplash_680px-500x383.jpg)
![[우울이라 쓰지 않고] 공통의 기원](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0/02/jared-rice-8w7b4SdhOgw-unsplash-500x383.jpg)
오늘 아침에는 ‘겨울이구나’ 하면서 출근했는데 이전 계절에 한껏 취한 글을 읽고 있자니 가을에게 되려 미안해지네요. ‘가을이구나’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올여름 다 갔구나, 곧 겨울이겠구나. 송이 밤의 안부도 궁금해요. 깊어지는 다음 계절에 대해서도 글로 만나뵐 수 있음 좋겠지만 아쉬운 게 더 좋을지도요! 다행인 건 출간 소식이 있네요. 책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전에 놓친 레터에서의 ‘마음의 지도’도 마저 잘 읽을게요. 수고하셨어요 :-) 올해 남은 계절 무탈히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월간소묘 레터를 구독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글을 순서대로 읽진 못했지만 오늘 작가님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니까 어쩐지 뭉클해져서 댓글을 씁니다. ‘불안한 가운데 용기가 되었다’고 전하시는 말씀에 제가 왜 따뜻해지지요 ㅎㅎㅎㅎ. 댓글부터 달고 최근글부터 차근차근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남은 책 작업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해요.
작가님의 글을 조용히 읽고 있었던 구독자 입니다. 실수로 산 밤 덕에 이렇게 좋은 글을 읽게 되어 밤송이가 고맙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해치지 않은 이야기 부분은 유독 두 번 세 번 곱씹어 보게 만드네요. 저도 오늘 퇴근길에 실수를 한 번 해 봐야겠어요. 그 실수가 다음 해 가을이 기다려질 멋진 이야기가 되면 더 좋겠네요.
작가님의 책 작업이 잘 마무리 되어 책으로 나온다니 얼른 만나보고 싶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