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한샘
집은 무엇일까. 집이란 공간은 어떤 의미일까.
나는 집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다. 지금껏 한 번도 경제적 논리의 ‘내 집’을 가져본 적 없으나 내가 머무는 모든 집을 ‘내 집’이라 생각하며 살았다. 얼마나 낡았든, 얼마나 작든, 얼마나 짧게 머물든 그곳은 나의 집이었다. 사는 동안은 마치 그곳에 평생이라도 머물 것처럼 가꾸고 돌보며 내 생활 패턴에 최적화시켜 놓았다.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책을 읽고 무언가 적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나는 안전하고 만족스러웠다. 하루 외출하면 사흘은 혼자 있어야 하는 내게 집은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는 피난처요, 도피처였다. 집 안에 있으면 평화로웠다. 한 번에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인간 신생아는 성장이 월등히 빠른 다른 포유류보다 돌봐주는 사람에게 더 크게 의존한다. 출생 후 불과 몇 분 만에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송아지를 생각해 보라. 인간의 아기는 생후 1년간 그런 움직임의 자유가 없다. 주변의 사람들이 부단히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자궁 밖에서도 1년간 발육해야 하고, 이 1년간 아기들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모나 삼촌이나 조부모에게 포대기나 아기띠로 묶여 있다. 그리고 먹여 주고 데리고 다니고 흔들어 얼러주고 놀아주어야 한다. 이 느린 성숙은 왜 인간들이 타인들과 그토록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일례다.*
막 태어난 아기는 상상 이상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눈을 뗄 수 있기까지 되려면 여러 번의 계절을 지나야만 한다. 어른과 아이가 나누어 쓰는 하루의 시간은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계획될 수밖에 없고, 그 계획은 마치 깨지기 위해 세워진 것처럼 시시때때로 수정된다. 집 안에서의 시간은 더는 고요하지 않으며 평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매 순간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작은 인간들을 돌보다 보면 나를 위한 공간은 사라지고 없다.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수도 없으며 먹고 싶을 때 먹을 수도, 졸릴 때 잘 수도 없는 집은 더 이상 피난처도 도피처도 아니다. 누군가를 계속해서 살피고 돌보아야 하는 의무감이 짓누르고 있지만, 동시에 그 존재들로 인해 행복하기에 부정적인 마음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공간이 되어버린다.
우리 집, 우리 아파트는, 분명 그의 마음속에 피난처의 이미지로 간직돼 있었을 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정리해야 할 상자, 준비해야 할 아이의 식사, 목욕시키기,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늘 정리 정돈 해야 하는 그런 공간의 이미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 않았던 셈이다.**
아이들이 일찍 잠든 저녁, 어지럽혀진 집을 정리하고 내일의 끼니를 준비한 후 책을 읽었다. 이른 저녁을 먹여 아직 밖이 훤한 시간에 이불을 잘 덮어준 후 그 일들을 수행했다. 빨리 재우고 빨리 치워야 나의 시간이 생기고, 그러면 다시 그 공간이 나의 도피처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속여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돌봄의 배턴을 이어받았어야 하는 반려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마주한 모습이 말끔히 치워진 집과 내일의 먹을 것, 그리고 자고 있는 아이들이었다고 생각하니 아니 에르노의 분노가 느껴지는 글이 마치 내가 쓴 것처럼 느껴진다. 고통과 행복이 공존하는 돌봄 노동의 공간에서 피어나는 복잡한 감정들은 출산을 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 진실과 함께 어지럽게 섞여 집 안에 존재했다.

책방을 하기 위해 페인트를 칠하고 타일을 붙이고 책장을 조립하며 몸과 마음은 힘들었으나 집이 아닌 곳에서 맘껏 읽고 쓸 수 있을 거란 기대로 즐겁기도 했다. 찾아오는 이들뿐 아니라 내게도 책방은 편안하고 아름다운 공간, 좋은 책과 좋은 음악으로 몸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테니까. 책방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신기해서 단어 자체가 편안함과 조용함, 느긋함과 같은 말들을 머금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신기함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노동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걸, 근무지로서의 책방은 또 다른 노동이 필요한 공간이지 피난처나 도피처는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건 언제였을까. 손목에 처음 물혹이 생겨 정형외과에 갔을 때였나,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였나, 아니면 애써 적은 엽서 뭉치에 반려인이 커피를 쏟았을 때였나….
일주일에 두 번은 이른 아침에 책방을 연다. 늦게 자는 인간, 저혈압 인간이라 오전에 활동하는 것을 힘들어하면서도 일찍 여는 이틀을 고수하는 이유는 아직 어린아이를 돌보는 이들 때문이다. 아이가 잠시 집을 떠나 있는 오전 시간에 갈 수 있는 곳 중 하나로 책방을 떠올리는 이가 있기를 바라면서 연다. 아이와 함께 오는 양육자 손님들이 있고, 처음에는 아이와 왔다가 보채는 아이에게 이끌려 서둘러 돌아간 후, 아이 없이 돌아와 전보다 훨씬 긴 시간을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모습에 나의 모습이 겹치지 않게 하려고 애쓰지만 기억의 힘은 너무 강하기에 “다음에 아이 없이 올게요”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꼭 오세요”라고 말하게 된다. 책방이 지금의 내게는 도피처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노동이 달려드는 공간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피난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챙겨야 하는 것들과 시끄러운 일들이 가득한 공간을 피해 마음의 안식을 찾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음 달이면 책방을 계약한 지 만 4년이 된다. 계속할지, 그만둘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오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어제는 옆집 미용실 ㅅ님과 커피를 마시며 “그때 페인트칠해야 하는데 40일 내내 비가 왔잖아요” 하며 웃었다. 올여름도 그때처럼 비가 올 것으로 예측하는 기사들이 있던데 벌써 걱정이 된다. 해가 들지 않아 가뜩이나 동굴 같은 책방은 내내 비가 오면 더 축축해지고 책들이 물기를 머금지 않도록 계속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날을 보내며 나는 조금 우울해질지도 모른다. 노동만 있고 책을 찾는 이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빗소리 들리는 책방이 누군가에게는 낭만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비타민D를 미리 주문해 본다. 조금 더 해보기로 한다.
*시리 허스트베트 <어머니의 기원> (김선형 옮김, 뮤진트리)
**아니 에르노 <얼어붙은 여자> (고광식 옮김, 레모 출판사)
─✲─
정한샘
2020년 7월 31일 가정식 책방 ‘리브레리아Q’를 열었다. 이탈리아에서 음악을 공부했고, 지금은 책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딸과 나눈 책 편지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는 마주 앉아》를 썼고, 그림책 《구름의 나날》을 옮겼다.
_리브레리아Q @libreriaq



‘가정식 책방: 리브레리아Q 서점원 노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월간소묘: 레터]에 연재되었습니다.
[가정식 책방: 리브레리아Q 서점원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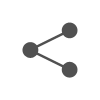
![[가정식 책방] 작은 일렁임이 파도가 될 때까지](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11/202310-630px-500x383.jpg)
![[가정식 책방] 여긴 뭐하는 곳인가요?](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05/01-630px-500x3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