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신유진
엄마는 화집을 모았다. 우리는 종종 책장을 채운 화집을 꺼내 보면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과 화가를 꼽아보곤 했다. 두 사람의 취향이 비슷했던 때도 있었고, 너무 달라서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도 있었다.
파리에서 살던 시절에 헌책방에서 화집을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엄마와 함께 봤던 그림을 다시 보는 반가움 또는 향수 때문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엄마가 알려줬던 그림의 제목과 프랑스어 제목을 비교해 보는 일이 작은 즐거움이었다. 어쩌면 나의 언어는 엄마가 쥐여준 것과 내가 발견한 것 사이에서 자랐는지도 모르겠다.
프랑스어를 막 배우기 시작했을 때, 화집을 보다가 정물화를 뜻하는 단어가 ‘Nature morte*’라는 것을 알고 놀랐던 적이 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력 없는 사물이라는 뜻이지만, 직역밖에 할 줄 몰랐던 그때는 ‘죽은 자연’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했고, 정물화를 보면 ‘죽은 자연’을 그리던 엄마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엄마는 그림을 배운 이후로 정물화를 자주 그렸다. 언젠가 엄마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정물화는 집에서 노는 여자들이 그리기 좋은 그림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내가 어릴 때 ‘여자들’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문장 중에 듣기 좋은 소리는 거의 없었지만, 미술의 한 장르조차도 모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그때 이후로 정물화를 좋아하게 됐다. 누군가 한계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해 버리는 것, 그것은 내가 저항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엄마가 남겨 놓은 에두아르 마네의 화집을 본다. 내 시선을 끄는 것은 <풀밭 위의 점심 식사>, <피리 부는 아이>, <올랭피아> 같은 대표작이 아니라, 화병에 담긴 꽃을 그린 그림이다. 나는 그 그림 앞에서 멈추고, 내 앞에는 나처럼 멈춘 꽃과 화병이 있다. 멈춰 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을 그리는 것은 뭐가 다를까?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야 알 수 없지만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멈춘 것들은 상상의 방향을 바꾼다. 다시 말해 멈춘 것은 멈춘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건너편을 상상하게 한다. 꽃이 아니라 꽃의 건너편에 있는 사람, 꽃을 바라보는 사람 말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보는 것은 꽃과 화병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마네다.
마네는 말년에 꽃을 그렸다. 악화된 건강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그에게 그릴 수 있는 것은 문병을 온 손님들이 들고 온 꽃이 전부였다. 꽃병에 꽂은 꽃을 보며 “이것들을 다 그리고 싶어”라고 말했다던 마네는 내게 투명한 유리병과 작은 꽃을 거대한 우주처럼 보이게 한다. 한계에 부닥친 순간에 다시 들끓는 인간의 열망만큼 커다란 것이 있을까.
“다 그리고 싶어.”
언젠가 엄마가 내게 했던 말이기도 하다. 하얀 캔버스와 사과와 꽃병과 접시 앞에서.

에두아르 마네, <크리스털 화병의 카네이션과 클레마티스>, 1882.
그러나 엄마는 붓질을 시작하기 전에 늘 망설였다. 낯선 언어를 처음 내뱉기 전에 짧은 숨을 내쉬거나 침을 꼴깍 삼키는 것처럼. 나도 그렇다. 첫 문장을 쓰기 전에 언제나 망설임의 시간을 통과한다. 어떤 것을 향해 자신을 완전히 열기 전에, 경계를 넘기 전에 경직되어 버리는 것은 망치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얀 캔버스도 하얀 화면도 우리에게는 너무 커다란 세계니까.
이브 버거는 아버지 존 버거에게 삶에는 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큰 것이 있고, 저마다 그 큰 그것을 다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고, 존 버거는 우리가 말하는 거대함이 우리가 직면한 어떤 것이 아닌 우리를 포함한, 우리를 둘러싼 것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너무 커다란 것은 뛰어넘는 게 아니라 뛰어들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었을까. 엄마는 그리고 싶은 그림 속에 뛰어들었을까? 엄마라면 그랬을 것 같다.
엄마의 그림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첫 번째로 품었던 질문은 엄마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유나 동기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이 내가 써야 할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엄마에게 질문을 건네는 쉬운 방식을 택했다.
“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테레빈유랑 린시드유 특유의 냄새가 있어.”
엄마의 답은 질문과 상관없이 이야기의 가장자리를 맴돌았다. 테레빈유와 린시드유의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기억의 문이 열리고, 어느새 나는 핵심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더는 중요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나와 엄마의 기억을 바라본다. 엄마가 작업실에 들어가 거기 존재하던 것을 바라봤던 것처럼. 생각해 보면 그건 엄마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기도 했다. 엄마는 주제가 아닌 가장자리를 먼저, 더 오래 그렸고, 그리는 것보다 바라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가장자리에 있는 게 자꾸 눈에 들어와.”
엄마가 말했다.
작업실의 가장자리에는 사과, 꽃병, 접시가 놓인 테이블이 있었고, 엄마는 그것들을 그렸다. 엄마는 그 그림들이 연습용이라고 했다. 언젠가 진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무엇을 연습했을까? 사과를? 꽃병을? 접시를?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나 역시 핵심이 아닌 엄마의 방식대로 가장자리로 향한다. 기억의 가장자리, 거기에는 엄마가 그린 육각형의 사과가 있다.
“사과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묻는다.
“빛이 닿는 곳을 그리고 싶었어. 사과가 빛에 반응해야 하잖아.”
엄마가 말한다.
“살아 있는 것은 빛에 반응하니까.”
엄마가 말한다.
“살아 있는 것 같지 않니?”
엄마가 묻는다.
살아 있는 것 같았다. 엄마의 그림 속 사물들은 멈춰 있는 순간에도 빛에 반응하며 또 다른 빛의 파편을 만들었고, 그것은 죽어서 멈춘 것이 아닌 멈춘 순간에도 지속되는 삶, 엄마의 삶과 닮아 있었다.
엄마의 정물화는 어떤 판단도 분석도, 특별한 의미 부여도 필요하지 않았다. 연습용이었으니까. 가장 평범하고 작은 사물들을 그리기. 멈춘 것에서 살아 있는 순간을 발견하기. 아마도 그것이 거대한 세계로 뛰어드는 엄마만의 연습이 아니었을까.
화가가 되지 못했던 엄마가 그린 그림은 사실상 모두 연습에 불과했고, 그 연습 끝에 엄마가 완성한 진짜 작품은 연습했던 시간, 엄마의 인생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내가 쓰는 글 역시 모두 연습이고, 이 연습 끝에 탄생하게 될 진짜 작품은 좋은 글을 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간, 나의 인생이라는 것도.

이제 엄마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무엇 때문에 그림을 멈췄는지 알 수 없다. 우리 사이에도 다 말하지 않는 것과 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게 한다. 다 말하지 않지만, 다 말할 수 없지만 이해받고 싶고, 이해하고 싶으니까.
엄마의 마지막 그림은 체리나무였다. 내가 체리를 따며 찍었던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이라고 했다. 가지마다 열매가 무겁게 열린 벚나무, 엄마는 본 적 없는 그 나무를 그렸다. 6월의 빛과 붉은 눈송이 같은 체리가 떨어지는 그림이다. 엄마는 나를 생각하며 그렸다고 했지만 그 그림에 내가 있는 것 같진 않다. 다만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과 “살아 있는 것 같지 않니?”라고 묻는 엄마의 목소리가 있을 뿐.
엄마는 그 그림의 제목을 <체리 따던 날>이라고 지었고, 나는 거기에 <사랑을 연습하는 시간>이라는 부제를 달아본다.
엄마가 연습한 모든 것이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다.
* nature는 자연이라는 뜻이고 morte는 ‘죽은, 죽은 것 같은’이라는 뜻의 형용사다.
** 존 버거, 이브 버거, <어떤 그림: 존 버거와 이브 버거의 편지>, 신혜경 옮김, 열화당.
─✲─
신유진
엄마의 책장 앞을 서성이고, 파리의 오래된 극장을 돌아다니며 언어를 배우고 이야기를 꿈꿨다. 산문집 <창문 너머 어렴풋이>, <몽카페>, <열다섯 번의 낮>과 <열다섯 번의 밤>을 썼고, 아니 에르노의 <세월>, <진정한 장소>를 비롯한 여러 책을 옮겼다.


‘엄마의 책장으로부터’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월간소묘 : 레터]에 연재되었습니다.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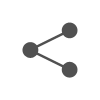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별거 아닌 것들의 별것](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1/202312-엄마의책장-그림-480px-500x383.jpeg)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첫눈 오던 날](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12/엄마의책장-202311-630px-500x3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