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이라 쓰지 않고>의 문이영 작가가 직접 책을 낭독합니다.
─
‘햇밤’ 중에서
[∙∙∙]
낮에 있었던 일이다.
장을 보러 갔는데 처음 보는 아저씨가 햇밤을 팔고 있었다. 한 바구니에 오천 원. 굵은 펜으로 눌러 쓴 글씨 뒤로 바구니 가득 담긴 밤을 보면서, 밤이 나오다니 정말 가을이구나 생각했다. 마트에서 파는 잘 손질된 매끈한 밤이 아니라 가시가 잔뜩 달린 옷을 입고 나온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어떤 밤송이는 푸른빛이 더 많이 돌았다. 오복소복 쌓인 밤송이 사이로, 함께 딸려 들어온 모양인지 밤나무의 것으로 짐작되는 이파리도 간혹 보였다.
내 앞에 놓인 밤들이 너무나 생생해서 밤이 태어나 자란 곳을 쉬이 상상할 수 있었다. 그곳은 새벽안개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가을 산. 다저녁때 이슬로 풀숲이 젖는 가을 산. 밤송이 아람 벌어지는 소리 무시로 울리는 가을 산. 그곳에 밤나무가 산다. 푹신한 낙엽 위로 밤송이를 떨어뜨리는 밤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무리 지어 살아가고 있는 밤나무들을 상상하다가 그만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것은 아저씨의 목청 때문이었다. 살 것 같은 모양새를 하고 파라솔 아래를 기웃거리자 안 그래도 우렁찬 아저씨 목소리에 갈수록 활기가 돌았다. “여기 다 오천 원! 마음에 드는 걸로 가져가요.” 그렇게 밤을 사온 것이다. 푸르스름한 가시를 보다가, 이파리의 출처를 궁금해하다가, 그것이 살았을 곳을 상상하다가. 얼떨결에 그러니까 실수로. 아저씨의 목청, 그보다는 가시 사이로 빼꼼 보이던 송이밤이 눈에 밟혀서 에라 모르겠다, 계획에 없던 밤을 바구니째 사고 말았다.
밤이라는 것이 원래 집에 들이면 계속 생각이 나게 마련인 건지, 밤을 처음 사본 나는 틈만 나면 밤을 생각했다. 글을 쓰다가도, 냉장고 문을 열다가도 불쑥불쑥 떠올라서 베란다에 나가 밤송이들이 잘 있나 확인했다. 나간 김에 창가에 붙어 서서 바람을 맞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러는 동안 가을을 곱씹었다. 내가 밤을 생각할 때마다 가을도 쫓아와서 내 곁을 기웃거렸다. 실수로 산 밤 한 바구니 때문에 나는 온종일 밤과 가을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사람이 된 것이 기뻤다. 어처구니없게도 잘 살고 있다는 기분마저 들었다.
[∙∙∙]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많은데 정작 그것들이 곁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계절. 가을에는 없는 것들에 대한 마음으로 깊어진다. 마냥 없기만 한 것은 아니다. 썩으면서 사라지고 사라지면서 짙어지는 여름의 잔향처럼, 텅 비어가는 가운데 짙어지는 것도 있음을 가을로부터 배운다.
그런가 하면 졸아들면서 깊어지는 맛은 어쩌다 맛본 무화과 케이크가 가르쳐주었다. 작고 둥근 접시에 담겨 나온 무화과 케이크를 한 입, 키가 작고 널따란 찻잔에 담긴 뜨거운 밀크티를 한 모금 번갈아 먹으며 속을 데우던 가을 밤, 뭉근하게 졸인 무화과를 씹으며 생각했다. 밤 맛이 나네. 그 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고 다녔다. 혹시 알고 계세요? 졸인 무화과에서는 밤 맛이 난답니다. 대화 중에 무화과가 등장하면 꼭 그 이야기를 했다. 그때마다 어처구니없게도 약간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잘 살고 있다는 기분마저 들었다.
조그맣고 낡은 나무 의자에 웅크리듯 앉으면 좁다란 서교동 비탈길과 가로수가 보이던 그 카페 역시 3년쯤 전에 사라졌다. 사진을 찍어둘걸, 넋두리는 매해 가을 반복된다.
그러니까 3년 정도 되었다. 넋두리도 밤 맛 나는 무화과 이야기도 말이다. 실수로 산 밤 얘기가 나온 김에 무화과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
아무도 해치지 않는 이야기를 많이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밤 맛 나는 무화과 조림이 그런 글이 될 수 있을까.
아무도 해치지 않는 실수를 하고 싶다. 그런 실수라면 되도록 많이 하고 싶다. 그런 실수를 잔뜩 한 후 실수에 관한 글을 쓰고 싶다. 실수로 산 밤송이 한 바구니가 그런 글이 될 수 있을까.
실은 뭔가를 흉내 낸 것인지도 모른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니까. 아저씨의 호객 행위와 밤송이의 색깔과 딸려 온 이파리에 기대어 뭔가가 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잘 사는 사람 혹은 조금 더 나은 사람, 가벼운데 짙은 사람, 무해한 농담을 하는 사람.
바야흐로 가을이다.
가을을 좋아한다. 가, 하고 말하려다 들이마시는 스산한 공기. 을, 하느라 혀가 입천장에 가벼이 붙었다 떨어지는 모양. 을, 하고도 남아 있는 여운. 모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다. 무엇보다 마르면서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서 짙어지는 만물을 보는 일이 사뭇 기쁘다.
들 위로 한 차례 더 낮게 꺾이는 햇살을 느끼며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돌아서서 보았다. 내 키만 한 옥수수 밭 사이로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것, 저기 숲 왼편 허리를 돌아 나가는 것, 돌아 나가며 사라졌다가 더 작아진 모습으로 나타나 멀리 언덕을 넘어가는 것. 여름의 뒷모습이라 생각되는 것을 오래 바라보는 동안 바람이 멎었다. 소란하던 새들이 조용해졌다. 숲 그림자가 길어졌다.
길어진 그림자를 달고 들어와 쌀을 안치고 저녁을 차렸다. 어둠을 몰아내고 싶지 않아서, 어둠 속에서 작고 노란 스탠드를 켜고 보랏빛이 한 줌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질 때까지, 일몰 속에서 천천히 밥을 먹었다. 여름의 마지막 빛을 꼭꼭 씹어 먹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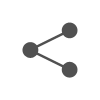
![[인터뷰] 문이영](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2/11/우울-북토크-680px-500x383.jpeg)

![[인터뷰] 김선진](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2/06/버섯-소녀-인터뷰F-500x383.png)
![[버섯 소녀] 작은 전시 X 오후의 소묘 오픈 스튜디오](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2/05/버섯-소녀-작은-전시F-500x38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