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이라 쓰지 않고>의 문이영 작가가 직접 책을 낭독합니다.
─
프롤로그
사람들은 우울을 싫어한다. 사실은 우울이 주는 취약한 느낌을 싫어하는 것이다. 우울이 저마다 외면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어떤 면, 무력하고 의기소침한 모습을 일깨우기 때문에. 우울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그래서 고되다.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데, 아닌 척 잘 살고 있었는데. 우울이 옮기라도 하듯, 사람들은 우울한 이를 멀리한다. 우울한 이에게 우울에 관해 말하지 말라고 한다.
우울을 긍정하고 싶지도 부정하고 싶지도 않다. 우울이 무언가를 가르쳐주었다 한들 우울이 견딜 만해지진 않았다. 우울이 무언가를 앗아갔지만 지나고 보면 어떤 것은 없는 편이 나았다. 우울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아직도 정확히 셈하지 못한다. 다만 우울에 관한 흔한 오해—우울이 단지 축축하고 기분 나쁜 상태, 단절과 고립을 가져오는 동굴 같은 곳이기만 하다는—에 관해서는 할 말이 있다.
이십 대를 지나며 여러 장소를 전전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어딜 가든 많이 걸었다. 밑창이 얇은 신발을 신고, 계절에 따라 달아오르고 식는 땅을 발바닥으로 가장 먼저 느꼈다.
걷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장소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언젠가 비탈 동네에 살게 되었을 때 한동안은 일부러 가파른 길로만 다녔다. 내가 사는 이곳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다리의 힘이, 매일 똑같은 길 위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마음의 눈이 절실했다.
벗어나지 못하면 걷기라도 해야지. 어둠이 내린 거리를 헤집고 다녔던 숱한 날들. 하지 못한 말과 고쳐 하고 싶은 말이 날마다 산적해서 걷는 동안 나는 중얼거리며, 간혹 울먹거리며 지나온 모든 시간을 ‘새로고침’ 하고 싶어 했다.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 했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앞으로만 걸을 수 있다. 희망도 다짐도 앞으로 던져야 한다. 그걸 몰라서 희망도 다짐도 잘하지 못했다. 우울은 내 안에 닻을 내리고 매번 내가 바라는 것보다 오래 머물렀고, 사람들이 각자의 희망과 다짐을 앞에 던져놓고 그걸 확인하러 달려가는 걸 보면서도,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여기를 걸어 다녔다.
걷다 보니 알게 되었을 뿐이다. 우울이라는 장소의 지형에 관하여. 우울의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산과 들, 바다와 언덕에 관하여. 그곳에는 어둡고 축축한 동굴 말고도 풀밭이, 풀밭 위로 치마폭을 일렁이는 태양이, 태양이 사라지면 자욱이 깔리는 안개가, 그 안개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산이 있다. 산에는 밤나무가 무리 지어 살고, 그들이 내어준 햇밤으로 어느 해 가을을 잘 살았다. 작게 노래 부르며 걷기 좋은 서쪽 바다, 늦여름 잔향이 오래 맴도는 북쪽의 숲과 들도 물론 빼놓을 수 없지만 끝에는 동네로 돌아왔다. 언덕 위 동네, 강 근처 동네, 골목이 미로 같은 북동쪽 동네…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나선을 그리며, 우울을 벗어나지 않고도 멀리 갔다. 우울을 데리고 먼 데까지 갔다.
풍경들이, 안보다 너른 바깥이 있어서 갇히지 않았다. 우울이 항상 내면에 갇히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우울은 열린 상태를 요구했다. 계속해서 흔들리기를, 사소한 것에 관해서조차 단언하지 못하기를 원했다. 우울은 어떤 것의 좋은 면보다 나쁜 면을 먼저 보게 했고, 믿을 만한 이름 뒤에 우리가 숨겨둔 것들을 끄집어내 부려놓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횡행하는 폭력, 자기 위안에 불과한 위로, 오직 본인만을 위해 발동하는 옹졸한 용기를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래서 어려웠다. 뒤틀린 사랑이 있음을 알고도 사랑을 믿는 일이, 위로와 용기의 이면을 알면서도 위로하거나 위로받고 용기를 내는 일이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들 없이 사는 일도 마찬가지로 가능하지 않았다. 사랑 없이, 위로를 하지도 받지도 못하면서, 한 줌의 용기조차 없이 불확실한 시간을 가로지르는 일은 고달팠다. 여전한 우울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수밖에 없었다.
산책이야말로 익숙한 장소에서 이방인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므로, 내가 아는 사랑과 위로와 용기가 새로운 무언가로 보일 때까지 걷고 또 걸었다. 걸을수록 아는 것은 줄고 모르는 것이 늘었다. 지난 시간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한참 걷다 돌아오면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익숙했던 풍경이 눈에 설게 느껴졌다.
이 책은 걷는 동안 마주한 우울의 낯선 풍경, 그 생소한 지형을 표시한 지도다.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우울의 면면을 연신 들여다보던 그 시간이, 실은 희망과 다짐을 앞으로 던지는 시간이었음을 이제는 안다.
살면서 걸었던 무수한 길을 떠올려본다. 길 위를 헤매며 얻은 것이 새로운 풍경만은 아니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익숙하고 자명한 세계를 보며, 내가 느낀 것은 분명 기쁨이었다. 쥐고 있던 것을 놓았을 때, 아는 것을 잊고 끝까지 갔을 때 얻어지는 불가사의한 기쁨. 보람이나 의미와는 상관 없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그러한 기쁨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막 던져진 나의 희망과 다짐이 내게 등을 돌리는 순간을,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풍경을 비밀스럽게 기다린다. 그리하여 미래의 어느 날에, 삶이 내가 기대했던 그 무엇과도 닮지 않은 모습으로 나를 저버린다면…. 그 낯선 풍경 앞에서 나는 기분 좋은 무력감에 휩싸일 것이다. 새로이 걸어볼 길도, 사랑할 것도 한이 없는 세상 속에서 특별하고 불가해한 기쁨에 겨울 것이다.
2022년 가을
문이영
─
﹅ 책 소개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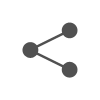
![[인터뷰] 문이영](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2/11/우울-북토크-680px-500x383.jpeg)

![[인터뷰] 김선진](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2/06/버섯-소녀-인터뷰F-500x383.png)
![[버섯 소녀] 작은 전시 X 오후의 소묘 오픈 스튜디오](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2/05/버섯-소녀-작은-전시F-500x38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