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도 그려낸 그림이 모두 팔리는 상상을 합니다. 살림이 넉넉해져서 물감 하나당 붓 하나를 씁니다. 지금은 붓 한 개로 모든 물감을 쓰고 있어요. 붓에 남은 물감을 닦아내거나 어두운 색을 쓰다가 흰 물감을 쓸 때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색은 한참을 빨아도 지워지지 않아서 흰색을 위한 붓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색깔별로 붓을 사두면 분명 편할 거예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다리 건너 잡화점 사장님이에요. 내 그림을 가져다 팔아주곤 하는 고마운 아저씨죠.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있잖아, 잘됐어! 어떤 손님이 네 그림을 모두 사갔지 뭐야.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감사하다고, 새로운 그림을 가져다주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볼 수 없어서 다행입니다. 입꼬리가 귓가에 걸리고 내 양발은 동동대고 꼬리와 엉덩이는 자꾸 흔들려요. 누가 보면 미친 고양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목구멍에서 고르릉 소리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심장이 크게 뛰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왜 그림을 샀을까요? 그림은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 어쩌면 한 장의 종이일 뿐인데요. 종이 한 장의 값으로 그림은 꽤 비싼 편이어서 누군가에겐 일주일 치 용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한 달 치 식량을 살 돈일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대신에 내 그림을 사다니. 나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게에 가져다 놓을 그림을 새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좋아하는 그림은 대부분 먹을 것이 그려진 그림이에요. 엽서 모양 종이에 팔린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해 질 녘의 구름색, 막 수확한 레몬의 색, 편안하고 소음 없는 순간들을 그렸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것들이 그리고 싶기도 했어요. 어제저녁 꿀벌이 자랑한 보드라운 털과 다리에 뭉쳐진 꽃가루를 그려보고도 싶었어요. 벌 뒷다리를 그린 그림을 누가 좋아할까? 꿀벌은 민망해했어요. 보통은 맛있거나 아름다운 걸 좋아하지 않겠어?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걸 그리는 게 좋지. 평소라면 아름다운 건 다 다른 거야, 라며 토를 달았겠지만, 오늘은 그 말이 맞는 거 같았어요. 팔린 그림들이 대부분 그랬거든요.
나는 부지런히 그림을 날랐습니다. 아저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손님을 내심 기다렸어요. 그림은 예전처럼 느리게 팔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장, 때로는 한 달에 한 장. 팔리지 않고 쌓여가는 그림들 속에서 나는 오래된 은행에 걸려 있던 어느 화가의 그림이 떠올랐어요.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의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한 화가였어요. 그는 정말 성에서 발가벗고 그림을 그렸고 그림은 끊임없이 팔렸습니다. 왠지 그중에서는 오로지 팔기 위해 그린 그림도 있을 거예요. 도시의 은행에서 사들였다는 그의 그림을 보았을 때 이 그림을 별로 그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네,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내 상상일 뿐이지만요.
왠지 그 기분이 손님을 기다리며 그려낸 내 그림에도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리로 치면 그럴싸하게 나온 접시 요리 같다고 할까요. 옆에 새빨간 토마토도, 으깨진 감자도, 두툼한 고기 한 덩이도 놓여 있는데 아무리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더불어 조급한 마음이 양념처럼 더해져 있었지요.
손님은 아마 오지 않을 거야. 확신이 들던 어느 날. 나는 책상 구석에 그림들을 밀어두고 긴 커튼을 꺼냈습니다. 내 키만 한 두루마기를 바닥에 펼치자 먼지들이 굴러 나왔어요. 그리고 한동안 거의 쓰지 않았던 검정 물감을 대야에 한가득 풀었습니다. 나는 오래된 붓으로 그동안 그리고 싶었던 것들을 그렸어요. 생선대가리 옆 마가렛, 꿀벌의 보드라운 뒷다리, 나를 보고도 여유로웠던 비둘기 한 쌍. 그리고 내 얼굴을 아주 큼지막하게 그렸습니다.
그림 그리는 마음은 왜 이리 변덕스러운지. 작은 그림을 그리다 보면 큰 그림을 그리고 싶고 세심하고 예민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거칠고 제멋대로인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어린 새순의 색깔을 쓰다 보면 저 멀리 산속 어딘가에서 굶주리는 들개의 털빛을 쓰고 싶어져요. 누군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의식해 그리다 보면 정작 내가 그리고 싶어 하는 것을 그리고 싶어 견딜 수 없습니다.
커튼에 그린 그림은 지저분하고 시커멨었는데요. 그림을 그리고 나니 목에 걸린 생선 뼈가 내려가듯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때로 일기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다 털어놓고 아무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 그림을 모두 사 갔던 손님이 이 그림을 봤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 나는 온몸에 검은 물감을 잔뜩 묻히고 작업실을 나섭니다. 나는 아주 가볍습니다.


‘고양이 화가’는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월간소묘 : 레터]에 연재되었습니다.
[고양이 화가]
그림을 안 그려도 된다 • 일기 같은 그림 • 나의 전시회/어린 고양이 화가 • 침대 위 정원사 • 지구에 그림 그리는 화가 일억 명 있다면 • 그려가는 와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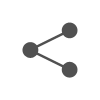
![[고양이 화가] 그려가는 와중에](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1/11/그림삽입-2-복사본-500px-500x383.jpg)
![[고양이 화가] 지구에 그림 그리는 화가 일억 명 있다면](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1/10/그림삽입-1-500px-500x383.jpg)
![[고양이 화가] 침대 위 정원사](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1/09/고양이화가-침대위정원사-680px-500x383.jpg)
![[고양이 화가] 나의 전시회 / 어린 고양이 화가](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1/08/고양이화가3-1-680px-500x383.jpg)
![[고양이 화가] 그림을 안 그려도 된다](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1/06/고양이화가1_1-500px-500x3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