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 고양이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지만 가끔은 이 이야기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수많은 화가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는 분명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화가도, 평생을 그림에 몰두했던 나이 든 화가도 있을 텐데. 마음마저 울렁대는 그림을 눈에 담을 때면 어떻게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 감탄하고 재능을 탐내고 왜 나는 저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하며 작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은 잠이 오지 않는 밤 적당한 습도와 공기 속에서 자라납니다. 배꼽과 땅이 수평을 이룬 상태에서 천장을 보았다가 침대 옆 벽을 보았다가 다시 천장을, 벽을, 뒤척거리는 사이에 자라납니다. 막혔던 혈관으로 피가 돌기 시작하는 것처럼 힘차게 자라납니다.
피어나는 한 무더기 덤불 속에서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눈물 찔끔, 이유 없는 서러움에 찔끔, 눈물은 최고의 자양분이에요. 부끄러움에 자격지심을 더해서 습해지는 베개 위에 현재의 걱정과 미래의 불안을 거름처럼 주고 나면 베개는 그 속에 박혀 있는 이상하고 묵은 것들을 피웁니다. 항아리에 담아둔 메마른 씨앗더미가 물을 만나 사정없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요.
나는 수풀 속에서 잠든 고양이처럼 아늑해 보이지만 사실 잠이 오지 않아요. 꿀벌의 곤한 숨결이 들립니다. 내 귓가로 빠르게 자라나는 식물의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식물은 말이 없지만 생명은 소리를 냅니다. 그것들을 헤치고 나와도 내가 서 있는 길을 제외한 모든 곳이 허공입니다. 해도 없는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뜨면 아침이에요. 나는 밤새 보송해진 털을 문지르며 일어납니다. 이불 안은 온기로 따듯하고 아늑합니다. 내가 밤새 키웠던 식물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라났는지 이유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다보면 사라지는 것들이 사는 도중에, 어떤 밤에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나는 정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거름을 주고 나무를 심는 정원사가 아니고 가위를 들고 무지막지하게 가지를 잘라내기만 하는 정원사가 되기로 합니다. 식물들이 내 가위를 보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가차 없이 해보기로 합니다. 그런 밤에는 그러는 게 좋아요. 순전히 나를 위해서 합니다. 내 가위는 볼펜이에요.
침대 옆에 수첩을 꺼내두고 그들이 새싹을 내기 전에 손을 움직여 그림을 그립니다. 부러운 것은 부럽다고 말하는 주인공과 말풍선을 여러 개 그립니다. 보통은 입에 담기 험한 말을 많이 하고요, 화를 잘 냅니다. 그 옆으로는 말풍선을 그립니다. 화를 내다가도 위로하고, 체념하기도 하는 고양이 화가가 그려집니다. 옆으로는 물 위에 둥둥 떠가는 오리 가족이나 별 의미 없는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기도 해요.
그림으로 불안해지는 마음을 그림으로 적당히 잘라내다 보면 그것들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해도 없는 밤. 달빛을 따라 낸 얇은 줄기로 흔적만 알릴 뿐이죠. 뿌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가지치기를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찾은 후로 무성했던 밤의 기분은 잘 자라지 않고 잠이 더 쉽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화가’는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월간소묘 : 레터]에 연재되었습니다.
[고양이 화가]
그림을 안 그려도 된다 • 일기 같은 그림 • 나의 전시회/어린 고양이 화가 • 침대 위 정원사 • 지구에 그림 그리는 화가 일억 명 있다면 • 그려가는 와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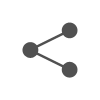
![[고양이 화가] 그려가는 와중에](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1/11/그림삽입-2-복사본-500px-500x383.jpg)
![[고양이 화가] 지구에 그림 그리는 화가 일억 명 있다면](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1/10/그림삽입-1-500px-500x383.jpg)
![[고양이 화가] 나의 전시회 / 어린 고양이 화가](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1/08/고양이화가3-1-680px-500x383.jpg)
![[고양이 화가] 일기 같은 그림](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1/07/고양이화가2_1-680px-500x383.jpg)
![[고양이 화가] 그림을 안 그려도 된다](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1/06/고양이화가1_1-500px-500x3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