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째 내 몸에 딱 맞는 간이침대 위에서 아침과 밤을 맞았다. 새해 첫 달부터 작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엄마의 곁을 지키는 중이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따님이 어머님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라고 하셔서 머쓱하게 웃었다. 평일과 주말할 것 없이 붙어 있으니 할 일 없는 철부지 같아 보이려나 생각했다. 하루에 한 번 가습기 물을 채우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식사를 대신 옮겨드리는 작은 일들을 했다. 조용하고 따듯한 온도의 병실이 꽤 안정적이어서 아침에는 엄마보다 더 늦게 일어나고 밤에는 누구보다 일찍 잠들어서 날이 갈수록 양 볼이 반질반질 빛났다.
집에서 가져온 이불로 아침 햇빛을 가리고 있을 때쯤 엄마와 옆 침대 아주머니들이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예전부터 엄마는 버스 정류장에 잠시 서 있는 찰나에도 꼭 옆 사람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아기라도 안고 있는 분이 계시면 100퍼센트의 확률이었다. 이번에도 반나절만에 양옆 침대 아주머니의 뵌 적 없는 가족들 소식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 사흘 정도 지나서는 병원 식당의 아주머니께서 내 몫의 식사까지 챙겨주셨다.
위급한 상황이 거의 생기지 않는 작은 동네 병원에서의 조용한 날들이 흘러갔다. 그중 유일하게 약속이 있던 날, 오후의 소묘 편집자님과의 두 번째 만남이 있었다. 인연 없이 그림을 보러 와주시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소중하지만 얼마 전 유독 눈에 띄는 SNS 게시물이 보였다. 나의 그림 옆에 다정히 붙은 문장. 그림을 그리며 내가 담은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지만 결말이 여러 개인 소설책이 생각 나 즐거웠다. 그분이 올리신 글과 사진들을 구경하다가 문득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다. 그리고 정말로 만났다.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정신없이 말하는 편인 나와 달리 차분한 편집자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덜컥 글을 써보기로 약속했다.
선물 받은 그림책들을 품에 안고 돌아와 가족들이 모인 병원 앞 식당에 갔다. 아직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콧구멍이 커진 채로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이제 두 가지의 일을 하는 작가가 되겠다고 말하자 아빠는 그래서 책이 언제 나오는지 물었다. 1년쯤 걸리지 않겠느냐 대답했는데 이 일은 벌써 2년도 훨씬 더 지난 일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어떤 마음과 이야기를 가졌는지 쓰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부족한 집중력 탓에 책의 같은 페이지를 여러 번 읽는 내가 글을 쓴다니. 다른 사람들의 글도 열심히 읽어보았지만 다들 어찌 이리 재미나게 쓴 것인지, 언제 이런 일을 겪고 이겨내고 성장했을까 매번 감탄만 하다가 끝이 났다.
그러는 사이 병실 멤버들과 정이 든 엄마는 문병을 온 손님들의 손에 들려 있던 비슷비슷한 과일과 음료수들을 서로 주고받은 후에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불이 자꾸만 삐져나가는 간이침대에서 슈퍼 싱글 사이즈의 침대로 돌아왔지만 편하지가 않았다. 잘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의 설레고도 무거운 마음에 눌려 있던 중 병원에서 매일같이 듣던 평범하고 기쁘고 슬픈 이야기들이 지나갔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앞에 앉은 사람이 맞아 맞아. 그치 그치. 하는 식의 꼭 두 번 소리 내는 호응의 리듬이 함께 들리는 듯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엄마에게 사람들과 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물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자기의 삶에서 중요한 곳으로 향하는 걸 볼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사는 게 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도 빌려보고 싶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했다. 혼자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스스로에게 하던 말들을 떠올리며 적어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나에게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태어난 후 첫 번째 기억이 뭔가요?
정말 별게 아니어서 말하지 않은, 못한 이야기가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나중에 자세히 적는다면 좋겠다. 특히나 마지막 질문은 엄마를 닮아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내가 자주 꺼내는 대화 주제였다. SNS에 인터뷰를 해줄 혜영들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예상 외로 다양한 혜영들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한가운데에 멈춰서 답장을 보내느라 짜증 섞인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괜찮았다.
예상대로 나는 그간 혜영들과의 대화에서 충분히 울고 웃었다. 호기롭게 시작한 것에 비해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처음 만난 눈을 마주 보고 나눈 이야기들이 넘실거린다. 겪어보지 않은 삶과 선택지들을 듣다 보면 나와의 공통분모를 찾아보게 되는데 혜영 들이 가진 이야기들은 온전히 그들의 것이라 소설책을 읽듯 듣고 집에 오는 길에 덮어두었다. 별게 아닌 이야기로, 혼자서 품어도 괜찮았을 이야기들을 말해보자고 했는데 결국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오래 마주 앉은 그림들은 전시장의 벽에 걸리기 전부터 나와 정이 들어 오래된 친구를 소개하듯 전시장 벽에 걸고는 했는데. 글들은 어떨까? 그림도 글도 혼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함께 다정히 듣고 쓰고 그려본 날들이었다.
연재 그림(2021.1~2022.1)


‘조용함을 듣는 일’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월간소묘 : 레터]에 연재되었습니다. (연재명 ‘김혜영의 혜영들’)
[조용함을 듣는 일]
물결이 내는 소리 • 홀로 피는 것은 없다 • 막, 막 • 빛추이 • 발가락 사이, 반짝임 • 마음과 몸의 모양 • 이 안에 사랑이 있구나 • 기대앉는 우리들 • 에필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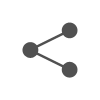
![[조용함을 듣는 일] 기대앉는 우리들](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2/01/기대앉는우리들-680sq-500x383.jpg)
![[조용함을 듣는 일] 이 안에 사랑이 있구나](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1/11/이안에사랑이있구나-680sq-500x383.jpg)
![[조용함을 듣는 일] 마음과 몸의 모양](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1/09/마음과몸의모양-680sq-500x383.jpg)
![[조용함을 듣는 일] 발가락 사이, 반짝임](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1/08/윤슬3-680sq-500x383.jpg)
![[조용함을 듣는 일] 빛추이](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1/05/빛추이-680sq-500x3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