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머니의 팡도르> 中
겨울이 조금씩 두터워지고 있어요. 아직 큰 추위는 오지 않았지만, 뉴스에서 풀렸다고 말하는 날씨에도 코끝이 시리고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게 돼요. 이제 곧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는 눈세상도 만나게 되겠죠. 게다가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어쩌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겉으로 내색은 안 해도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나 하며 설레는 마음만으로도 이미 행복해진 느낌이 들기도 하죠.
어떤 크리스마스가 되더라도 그날을 보내고 나면 올해도 이제 끝자락이에요. 하루가 가는 일이 일 년의 어느 때보다 안타깝게 느껴지는 날들이죠. 어쩌면 이미 쓸쓸함과 아쉬움에 가느다란 한숨을 뱉는 일이 잦아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끝이란, 그 너머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걸 알아도 대체로 그렇게 ‘멜랑꼴리’ 하더라구요. 그래도 다행이지 뭐예요. ‘한 해의 종말’이 선사한 차가운 생채기를 크리스마스가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니까요. 가족이나 연인, 친구나 동료와 함께 보낼 따뜻하고 포근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한 해가 끝나는 아쉬움도 조금은 잊을 수 있죠.

Photo by Annie Spratt on Unsplash
아이들은 몇 배나 더 큰 기대감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거예요. 아이들의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역시나 산타클로스, 선물 주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바로 그분 때문이죠. 사실은 엄마나 아빠가 산타클로스라는 비밀이 탄로 났다고 해도 상관 없어요. 그렇다고 머리맡 커다란 양말이 비어 있진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떠올려 보다가 ‘산타 할머니’는 왜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어딘가에 산타 할머니도 있지 않을까요?
이탈리에는 ‘베파나(Befana)’ 할머니에 관한 전설이 있어요. 할머니의 외모는 우리가 마녀라고 부르는 모습과 닮았어요. 큰 코에 주름투성이 얼굴을 하고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베파나 할머니가 사실은 산타 할머니예요. 이탈리아의 성 니콜라스 축일인 1월 6일에 아이들에게 선물(사탕)을 나눠주고 다니거든요. 아이들은 베파나 할머니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 양말을 걸어두고 잠든다고 해요. 우리가 아는 산타클로스 이야기랑 비슷하죠?

<할머니의 팡도르> 中
베파나 할머니는 원래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 세 사람과 함께 공현에 나선 이들 중 하나였대요. 한참 오래전 이야기죠.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되는 성 니콜라우스 주교가 3세기경의 인물이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풍습이 생긴 건 그보다 훨씬 뒤라고 하니까 베파나 할머니가 적어도 선물 전문가로서는 산타클로스보다 선배인 셈이죠. 어쩌면 산타클로스를 베파나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베파나 할머니는 착한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주지 않아요. 말을 안 듣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선물을 나눠준답니다. 비록 검은 석탄이기는 해도 말이에요. 아이들이란 차별 없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어른의 말을 안 듣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사탕이 아닌 석탄을 받게 될지라도 말이에요.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 때론 천사처럼 착한 마음씨를 보여주다가도 어떨 땐 (어른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나빠 보이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 모두가 아이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어른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불완전한 아이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파나 할머니는 비록 (어른들이 보기에) 나쁜 행동을 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선물의 향연에서 배제하지 않고 공평하게 양말을 채워주는 게 아닐까요. 그게 더 어른스럽고 다정한 일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물이 비록 검은 석탄이라고 해도 말이죠.

<할머니의 팡도르>는 베파나 전설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그림책이에요. 한 마을의 외딴집에 사는 어느 할머니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온갖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설탕과 향신료에 졸인 귤, 아몬드를 잔뜩 넣은 누가, 아이싱 쿠키, 바삭하게 구운 찰다 그리고 할머니만의 비법으로 만든 금빛 팡도르까지.
*찰다: 이탈리아의 디저트용 과자 *팡도르 : 판도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빵.
그렇지만 할머니의 크리스마스 준비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주름이 잔뜩 생겨 쪼그라든 할머니는 “죽음이 나를 잊은 게야.”라고 혼잣말을 할 정도로 나이가 많았거든요. 게다가 죽음 역시 할머니를 잊은 게 아니었어요. 한창 음식을 준비 중인 할머니의 외딴집에 사신이 불쑥 찾아왔어요. “나랑 갑시다.”라고 말하는 사신에게 할머니는 대뜸 잠깐 기다리라고 하곤 준비하고 있던 음식의 맛을 봐 달라고 해요. 그리고 사신이 이빨에 낀 건포도 조각에서 나는 가을날 포도밭의 정취에 현기증을 느끼며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그럼 일주일 뒤에 봅시다.”라고 하며 문을 닫아 버리죠.

직업 정신이 투철한 사신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가 없죠. 일주일은 고사하고 사흘 만에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다정하게 자신을 반기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사신은 당황하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맛을 보라며 건네는 빵에서 생의 맛까지 느껴버리고 말죠. 단단히 각오하고 “약속대로 빵을 맛보았으니 그만 갑시다.”라고 말해 보지만, 말랑한 누가 반죽이 바삭해지려면 하룻밤 식혀야 한다는 할머니 말에 또다시 빈손으로 외딴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뒤로도 할머니와 사신의 티격태격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요. 할머니는 크리스마스 음식을 무사히 아이들에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사신은 과연 할머니를 데리고 죽음의 세계로 갈 수 있을까요?

<할머니와 팡도르>는 섬세한 선과 따뜻한 색감의 그림과 달리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에 관해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무섭거나 무겁지 않아요. 오히려 책장을 넘기는 내내 유쾌한 이야기가 이어지죠. 할머니(삶)와 사신(죽음)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글을 쓴 안나마리아 고치, 그림을 그린 비올레타 로피즈) 두 작가는 어쩌면 ‘삶과 죽음, 둘 다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얘길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착한 아이에게도 나쁜 아이에게도 모두 선물을 주는 베파나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죠. 죽음 너머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해요. 살았을 때 하나라도 더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치열하지 않은 삶은 제대론 된 삶이 아닌 것처럼 말하곤 하죠.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많은 걸 가지려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기도 하죠. 하지만 죽음을 떼놓은 삶이 왠지 공허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외딴집 할머니는 사신을 무작정 거부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금 기다려달라고 할 뿐이었죠. 해야 할 일이 조금 남았거든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크리스마스 음식을 내놓는 일, 그리고 자신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일. 죽음이란 결국 미래를 염두에 둘 때 삶과 함께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닐까요. 경계의 끝에서 모든 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유산이 미래로 전승되는 과정의 일부가 죽음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외딴집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요리 비법을 남겨주었어요. 우리가 여전히 맛있는 팡도르를 먹을 수 있는 걸 보면 아마도 그 비법은 무사히 전달되었나 봐요. 이번 크리스마스 식탁엔 금빛으로 반짝이는 팡도르를 올려 보세요. 향기롭고 달콤한 과자들과 함께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사신의 우물쭈물함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점에서 보기
서점에서 보기
• 교보문고
• 알라딘
• 예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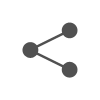
![[인터뷰] 문이영](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2/11/우울-북토크-680px-500x383.jpeg)


![[인터뷰] 김선진](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2/06/버섯-소녀-인터뷰F-500x383.png)
![[버섯 소녀] 작은 전시 X 오후의 소묘 오픈 스튜디오](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2/05/버섯-소녀-작은-전시F-500x38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