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지혜 (지혜의서재)
아니 에르노의 <한 여자>, 이 책을 덮고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다. 나는 나의 어머니에 관해 떠오르는 것이 거의 없었다. 아니 에르노는 자신의 어머니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부터 그녀의 근원인 할머니와 유년 시절, 결혼 전과 후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 책에 담았다. 나도 그녀를 따라 천천히 떠올려보았다. 나의 어머니의 역사를. 그런데 시작부터 막혔다.
‘엄마를 인터뷰해야겠다!’
2년 전쯤 리베카 솔닛의 <멀고도 가까운>을 읽었을 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 그때 처음으로 엄마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엄마가 조금이라도 불행을 내비치면 나도 그 불행에 휩싸여 버릴 것만 같았다. 그래서 궁금한 채로 내버려뒀다. 이번엔 다가갔다. 내가 모르는 그녀의 역사에, 그녀의 행복과 불행에.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리가 내 안에 생겼다. 그것을 이 책, 아니 에르노의 <한 여자>를 읽고 깨달았다.
/
엄마는 요즘 뜨개질에 빠졌다. 어릴 때 나와 동생 옷, 모자, 양말까지 떠서 입히던 실력의 소유자였는데 엄마와 아내로 사느라 그 실력을 잠시 묻어두고 있었다. 동생이 묻혀 있던 엄마의 뜨개질 실력을 기억해냈고 엄마에게 다시 해보는 거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는데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빠져들어 버렸다. 내가 엄마를 인터뷰하려고 할 때 엄마는 뜨개질에 한창 몰두해 있었다.
“엄마, 인터뷰 좀 하러 왔습니다.”
“…….”
“엄마?”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며 새로운 기술을 연마 중이었다. 내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하지만 나도 지금 써야 했기에 꿋꿋하게 다시 엄마를 불렀다.
“엄마, 엄마는 대답만 하면 돼.”
“응.”
“엄마는 어디서 태어났어?”
엄마는 1957년 1월 14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7남매 중 여섯째다. 장래희망은 없었다. ‘그때 무슨 꿈이 있어, 그냥 사는 거지’ 하셨다.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꿈 없이 사는 건 아니었을 텐데 엄마는 그런 소녀였다. 7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나서 자신만의 꿈을 갖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소녀.
초, 중, 고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아빠를 만났고,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했다. 결혼과 동시에 하던 일은 그만두었고 1년 만에 나를 낳았다. 엄마의 결혼 생활은 반지하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그곳에서 태어났다.
“엄마는 아빠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 친구 없었어?”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어? 엄격하셨어?
계속 질문을 했지만 엄마는 뜨개질 때문에 대부분의 질문을 듣지 못했고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인터뷰는 거기서 마쳐야 했다. 조용히 노트를 덮고 일어나 노트북 앞에 앉아 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제야 엄마가 고개를 들고 “다 한 거야?” 묻는다. 나는 그냥 ‘응’이라고 대답했다. 앞으로 천천히, 조금씩 이야기를 나눠야지.
내 대답을 듣자마자 엄마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뜨개질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뜨더니 우리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나는 뜨개질 천재인 것 같아.”
엄마에게 뜨개질을 권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인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열심히 컵 받침을 만들면서
“너무 재밌어. 피곤해도 이거 만들고 있으면 다 풀려”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걸 듣고 ‘조금 더 일찍 권할걸’ 하는 약간의 후회와 ‘권하길 잘했다’ 하는 뿌듯함이 동시에 몰려왔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면 옛날 드라마를 보며 누워 있던 엄마는 이제 티브이는 거의 보지 않고 환한 불빛 밑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실과 바늘을 가지고 자기만의 세계로 떠난다. 누가 불러도 듣지 못할 정도로 두세 시간씩 몰입한다.
장래희망 같은 건 가져본 적 없던 소녀였는데 그런 엄마에게 꿈이 생겼다. 뜨개질 연습과 연구를 꾸준히 해서 실력이 만족스러워지면 ‘미자’라는 본인 이름을 걸고 자신이 만든 것을 팔아보고 싶다고 한다. 그동안 엄마가 연습 삼아 만든 컵 받침, 냄비 받침, 수세미가 내 무릎까지 올 만큼 쌓여 있다. ‘지혜의서재’와 ‘슬기로운생활’을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드리라고 나와 동생에게도 후하게 나눠줬다. 몇몇 분들에게 드렸는데 엄마가 만든 거라는 걸 알고 따뜻한 응원의 말들을 해줬다.
“엄마~ 잘 받으셨대. 아까워서 못 쓰겠다고 하네~” 하고 전해줬더니, “그래?”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지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인터뷰는 망했지만 몇 시간째 정수리만 보인 채 뜨개질에 몰두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에 안도감이 느껴졌다. 훗날 나도 아니 에르노처럼 엄마에 관해 긴 글을 쓰게 된다면 이 장면이 꼭 들어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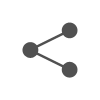
![[쓰기살롱 노트] 소묘](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0/11/jr-korpa-okPI73-l78E-unsplash_680px-500x383.jpg)
![[쓰기살롱 노트] 동그라미의 가장자리](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0/11/nasa-rTZW4f02zY8-unsplash_680px-500x383.jpg)
![[쓰기살롱 노트] 고양이라는 이름의 문](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0/10/고양이라는이름의문_680px-500x383.jpeg)
![[쓰기살롱 노트] 결국 나도 말하고 싶어졌다](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0/08/당신의말을내가들었다-e1596300138780-500x383.jpg)
![[쓰기살롱 노트] 파도 10퍼센트](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0/08/ben-m-GfJfHC-3yWc-unsplash_680px-500x3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