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지혜 (지혜의서재)
소개팅 경력 10년이 되자 가장 쉽고 빠르게 소개팅을 해치워버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저녁 시간 전, 약 4시쯤 만나 차를 마시고 헤어지는 것. 나는 항상 30분 정도 일찍 나가 내가 마실 음료를 시키고 앉아 책을 읽었다. 이런 방법까지 찾게 된 건 모르는 사람(대부분 맘에 들지 않는 사람)과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괴롭기 때문이었다. 싫어하는 사람, 어색한 사람, 모르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거나 남기거나 체했다. 그러던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진짜? 언니가 먼저 밥 먹자고 하는 건 처음이네? 웬일이야.”
동생이 놀라며 물었다. 내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동생을 통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내게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다행히 그들은 흔쾌히 내 제안을 받아줬고, 나는 자주 가는 낙지 볶음집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평소 즐겨 먹는 메뉴를 시켰다. 익숙한 장소, 익숙한 메뉴가 나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던 걸까.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그들과 어색함 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는 공백없이 이리저리 경쾌하게 날뛰었다. 음식이 나와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모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강아지, 나와 동생은 고양이. 강아지들도 이야기를 나눠보니 성격이 다 달랐고, 고양이와 다른 종인데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들이 주는 행복, 그들 때문에 느끼는 불안과 슬픔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박장대소하기도 하고 침울해지기도 했다. 쉴 새 없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집에 있는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집사는 어쩔 수 없다.
반려동물 이야기가 끝나고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맛집에 줄 서듯 이어졌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치 계속 만나온 사람들처럼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도 어색하지 않게 쏟아냈다. 생각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했다. 나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흘러 들어갔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나에게로 흘러들어왔다. 자연스레 궁금한 것들이 생겨났고 그렇게 이야기는 우리 사이를 동그랗게 돌고 돌았다. 그사이 눈앞에 음식들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버스 시간이 되어 겨우 일어섰다. 그들을 배웅하고 돌아서며 나도 동생도 연신 신기해했다. 내가 먼저 식사 제안을 한 것도, 이렇게 맛있게 먹은 것도 동생은 처음 보았을 풍경이고 나로서도 거의 처음 경험한 일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그럴 수가 있었을까.
타인에 관한 호기심도 없고 호기심은커녕 경계심만 가득했던 나. 눈을 밖으로 돌리면 인간에게 환멸만 느끼던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자꾸 안으로, 책으로 숨어들었다. 내 곁에 있는 이들과 책 속에 존재하는 이들에게만 관심을 뒀고 호기심을 느꼈다. 사람을 만나도 궁금한 게 없으니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 맺은 관계는 없었다. 대부분 필요에 의해 만나고 그 일이 끝나면 관계도 끊어졌다. 가끔 상대가 연락해 올 때도 있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만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사람들과도 밥 한번 먹지 않는 사람이 나였다. 계속 나는 그런 사람인 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
SNS를 꾸준히 해왔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두 계정은 꽤 오래 유지하고 있다.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하며 채워갔다. 나의 활동이 차곡차곡 쌓임과 동시에 그것을 함께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사가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려줬다. SNS가 나의 세계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관심사과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 현실 세계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해줬다.
내가 처음 지혜의서재를 열었을 때 나의 처음이 초라하지 않게 만들어 준 사람들도 그들이다. 우르르 몰려와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고 힘을 실어줬다. 책 낭독 팟캐스트를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망설이고 있을 때, 이제 막 시작하려 할 때 힘이 된 말들이 있었다.
“늘 응원해요.”
“응원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사이지만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마다 진심 가득 담아 따뜻한 토닥임의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 매달 후원금까지 보내준다. 후원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따뜻함의 말은 큰 힘이 된다.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주고 그 한 사람만은 나를 지켜봐 주고 있다는 생각에 든든해진다. 반면 나는 그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준 것이 없는데 어쩜 그는 그렇게 한없이 베풀기만 하는 걸까. 신기한 사람이었다. 처음엔 의심했다. 뭘 바라는 걸까? 나의 뭘 보고 저러는 거지? 하지만 곧 알 수 있었다. 바라는 것 없는 온전한 ‘선의’라는 것을.
그 선의가 시작이었을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온전한 선의가 꽉 닫혀 있던 내 마음의 문 사이로 조금씩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로 인해 계속 조금씩 흔들리던 문이 끼익 열린 순간이 바로 며칠 전 식사 시간 아니었을까. 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이후 다른 이들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의 마음도 망설이지 않고 전하곤 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받았던 선의 가득한 마음들이 나를 바꾼 것 같다. 나는 ‘변화’한 것이다.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이기적이고 경계심 많았던 내가 베푸는 법을 배우고 손 내미는 법을 어느새 배우고 있었다.
앞으로 있게 될 즐거운 식사 시간이 기대된다. 함께 먹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오른다.

*글 목록 이미지 출처 : Photo by Juliette F on Unspl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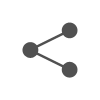
![[쓰기살롱 노트] 소묘](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0/11/jr-korpa-okPI73-l78E-unsplash_680px-500x383.jpg)
![[쓰기살롱 노트] 동그라미의 가장자리](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0/11/nasa-rTZW4f02zY8-unsplash_680px-500x383.jpg)
![[쓰기살롱 노트] 고양이라는 이름의 문](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0/10/고양이라는이름의문_680px-500x383.jpeg)
![[쓰기살롱 노트] 결국 나도 말하고 싶어졌다](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0/08/당신의말을내가들었다-e1596300138780-500x383.jpg)
![[쓰기살롱 노트] 파도 10퍼센트](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0/08/ben-m-GfJfHC-3yWc-unsplash_680px-500x3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