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민정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산다. 해야 할 일들도 넘쳐난다.
몇 년 전 “사람들은 대부분 바쁜 척하고 산다며, 다만 어린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외. 그들은 정말 바쁜 것이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다. 그래, 나는 바쁜 척 아니고 정말 바쁜 사람이야. 그렇게 공신력 없는 그 글에서마저 위로를 받던 날들이 이어졌다.
아이를 키우면서, 책임이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체감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을 책임져야 한다. 인간은 성인이 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동물이란 생각도 든다. 아이의 마음과 미래를 미루어 짐작하여 선택까지 대신해야 하는 무거움도 내게 주어졌다.
나는 아이 둘에게 나의 반을 뚝 떼어 주었다. 그러나 반을 넘기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워나가며 욕도 먹고 가끔 울음도 견디며 지탱한다. 나머지 반을 내 것으로 채워 넣기 위해 조용한 싸움을 계속해나간다. 그것은 나뿐 아니라 아랫집, 앞집의 아이를 가진 여자들이 하는 싸움이다. 그들이 내놓은 자신의 함량은 각자 다를 것이다. 나에게는 50퍼센트다. 나머지 40퍼센트에는 일도 취미도 공부도 욕망도 있는데, 그건 언제나 유동적이다.
나의 90퍼센트를 가득 채우는 것들이 나를 짓누를 때, 나는 파도 소리를 들어야 한다. 파도의 영역인 10퍼센트에는 오롯이 파도만 존재한다. 그곳이 내 쉴 곳이다.
파도 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다. 쓸어내리는 듯한 공명은 귓구멍을 타고 들어와 명치에 있는 답답함을 밀어버린다. 그 소리는 또 다른 쪽 귓구멍을 타고 뇌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느낌이다. 호수에 물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 그사이 낀 이물질을 제거하듯이. 그래서 나는 그 파도를 내 안에 품고 산다. 우주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증거를 몸소 보여주고 들려주는 파도의 원초적인 소리는 세속에 파묻혀 더러워진 나에게 잠시 쉬라고 속삭인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나는 어릴 적에 틈만 나면 부모님과 바다에 놀러 갔다. 커서도 친구들과 무리 지어 모이면 바다에 가는 건 일도 아니었다. 중고등학교 시절엔 내 방에서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았다. 바다는 내게 당연한 존재였고, 익숙해서 소중한 줄 몰랐던 공기 같았다. 그러다 대학에 오면서 바다와 멀어진 나는 그제야 내 안에 20년 동안 소리 없이 자리 잡은 바다가, 그 바다의 파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때는 사무친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바다가 보고 싶었다. 시간이 없어서 차선책으로 가까운 서해를 찾아가면, 채워지지 마음을 안고 돌아와야 했다. 서해에는 넓은 벌과 아름다운 석양이 있지만, 세찬 파도는 없었다. 파도 소리를 들어야 했다.
요즘은 파도를 보러 가는 시간조차 내기 어렵고 다녀오면 여행 후 동반되는 피곤함도 해소할 시간 없이 허덕대지만, 기묘한 파도의 능력은 바로 그 치유 능력이다. 내 안에 갇혀 칠렁이던 파도가 진짜 파도를 만나면 마치 전지전능한 합체 로봇이 된 것처럼 힘이 난다.
지난주에 6개월 만에 드디어 남편과 함께 바다를 보러 갔다. 눈에 가득 파도만 담을 수 있는, 인적이 드문 바닷가에 도착했다. 내리자마자 아이들은 거침없이 뛰어다녔다. 파도를 맞서기도 하고 파도를 따라가거나 파도를 가로질러 뛰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서 사진을 마구 찍었다. 나의 50퍼센트와 나의 10퍼센트가 만나 나의 일과 취미인 사진으로 담고 있으니 나를 가득 채운 행복한 순간이 거기 있었다. 아이는 집 앞에 바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처럼 나의 아이들 마음속에 파도를 담아주고 싶다. 살면서 지칠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10퍼센트를 아이도 스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 더 좋겠지만, 10퍼센트보다 적게 만들어 각박하게 살진 않기를 바란다. 나도 그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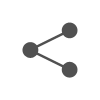
![[쓰기살롱 노트] 소묘](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0/11/jr-korpa-okPI73-l78E-unsplash_680px-500x383.jpg)
![[쓰기살롱 노트] 동그라미의 가장자리](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0/11/nasa-rTZW4f02zY8-unsplash_680px-500x383.jpg)
![[쓰기살롱 노트] 고양이라는 이름의 문](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0/10/고양이라는이름의문_680px-500x383.jpeg)
![[쓰기살롱 노트] 결국 나도 말하고 싶어졌다](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0/08/당신의말을내가들었다-e1596300138780-500x383.jpg)
![[쓰기살롱 노트] 그녀의 꿈](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0/07/photo_2020-07-06_15-05-37_680px-500x3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