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신유진
엄마는 사계절 내내 맨발로 다닌다. 겨울에도 양말 신은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엄마의 발은 햇빛과 흙과 굳은살로 누런빛이 돈다. 그 발로 여름에는 슬리퍼를 겨울에는 운동화를 구겨 신고, 집에서 시장을 통과해 몇십 년째 일하는 가게까지 딱 5분 거리를 걷는다. 사람의 일평생이 그 5분 거리에 다 있는 것처럼. 느리고 무거운 걸음으로.
시장에 있는 가게가 엄마의 일터가 된 것은 아빠의 사업 실패 때문이었다. 엄마는 그곳에서 옷, 액세서리, 화장품을 팔았고, 말과 시간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하며 아빠가 잃은 것을 하나씩 되찾아왔다. 엄마가 식구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낼 때마다, 회복할 때마다 나는 엄마가 가장으로 사는 시간 동안 무엇을 잃었는지 궁금했다. 양말이었을까? 어느 날, 엄마의 망가진 발을 보면서 엄마가 잃은 것이 양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여름에 즐겨 신었던 발목까지 오는 단정하고 하얀 양말, 겨울에 포근하게 발을 감싸던 털양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작은 배려 같은 것.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를 견디며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하는 발은 좀처럼 타인에게 위로받기 힘든 부위다. 고된 하루 끝에 이불 속에서 말없이 피로를 감내하고, 다음 날 다시 일어나 걷는 엄마의 맨발이 나는 꼭 엄마와 닮은 것 같다.
“양말을 왜 안 신어?”
언젠가 길을 걷다가 엄마에게 물었다.
“몰라. 하루를 정신없이 살다 보면 발이 너무 뜨거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엄마는 무심하게 답했다.
엄마의 발과 닮은 발을 본 적이 있다. 프랑스 중부지방, 오베르뉴에 살 때였다. 중앙 산지를 차지하는 그 고장의 또 다른 이름은 화산의 땅. 어느 늦여름에 친구들과 해 질 무렵, 화산이 잠든 산에 올라 저녁 피크닉을 즐겼다. 헤드랜턴으로 서로의 잔을 비추면서 와인을 마시고, 야간 트래킹을 즐기는 여행자들의 텐트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한참 신나게 놀던 그때, 무용수인 한 친구가 신발과 양말을 벗고, 축축한 풀과 검은 돌을 밟으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다 발을 다칠 수 있다는 만류에도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안 다쳐. 나는 춤추는 사람이라 발이 나무토막처럼 단단해. 너희들도 벗어봐. 함몰과 융기를 반복한 땅의 기운을 오롯이 느끼려면 맨발이어야지.”

이사도라 덩컨(1915-1923년경) photo by Arnold Genthe
헤드랜턴의 불빛을 따라 움직이는 그 두 발을 보며 엄마를 떠올렸던 것은 굳은살이나 망가진 발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화산의 땅을 제일 먼저 마중하러 나간 것이 그의 발이었기 때문이다. 실체 없는 생각을 만드는 머리나, 숨어서 뛰는 심장, 한없이 가벼운 입술이 아니라, 그의 발이 먼저 세계를 두드리고, 만지고, 느끼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 춤이 엄마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과 무척 닮았다고 느꼈다. 화산의 땅을 뜨겁게 마중하는 춤처럼 엄마는 매일 생을 열정적으로 맞이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신나는 음악에 맞춰 공중에 뜬 것처럼 격렬하게 춤을 추던 그가 다시 신중하게 땅을 밟았다. 그의 발은 마치 고막이 있는 것처럼 땅에 밀착하여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맨발로 서면 내가 땅과 하나가 된 것처럼 느껴져. 풀이나 돌이나 벌레처럼 땅의 일부가 된 것 같아.”
그는 그렇게 말했고, 춤이라기보다 영혼의 의식 같았던 그의 움직임이 내 기억 속에 있던 책 한 권을 다시 펼치게 했다.
춤은 무엇을 증명하거나 제시하기 위하여 추는 것이 아니다. 춤은 등의 아름다운 선을 자랑하고 팔다리의 기교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보여 주겠다는 의지가 강해질수록 춤은 보이지 않고 춤추는 자의 몸만 보인다. 보이는 것은 춤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으니 나를 보아주세요’ 하고 말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런 춤은 보는 이를 괴롭힐 뿐이다. 그것은 춤이 아니다. (…) 이제 나의 춤은 완전한 ‘자기 없음’이 되어야 한다. 관객을 의식해서도 안 된다. 자아를 의식해도 안 된다. 오직 순수한 에너지의 흐름만이 몸에 실려 저 영원의 율동을 남게 해야 한다.
_홍신자, 〈자유를 위한 변명〉
나와 엄마를 단번에 매료시켰던 사람, 홍신자의 말이다. 내가 그의 춤을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은 약 8년 전, 파리의 한국 문화원에서였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전에 춤이 아닌 글로 그를 알고 있었다. 자유로운 춤꾼이자 세계를 떠도는 구도자, 홍신자.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학교와 입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내게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뉴욕에서 무용을 하다가 인도로 떠나 수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를, 그의 떠날 수 있는 용기를 나와 엄마는 오랫동안 동경했다. 우리는 홍신자의 《자유를 위한 변명》을 읽으며 각자의 자유를 꿈꿨고, 그때 우리에게 자유란 ‘벗어남’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엄마와 나는 벗어나길 원했다. 엄마는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삶으로부터, 나는 나를 보호하고 제약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다. 내게 익숙한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도 다시 새로운 감옥을 만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내가 홍신자의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더는 자유를 찾지 않으면서였다. 그저 하루를 사는 일이 전부였을 무렵, 화산의 땅에서 엄마의 발을 떠올리게 하는 친구의 발을 보며 나는 구도자, 홍신자를 다시 생각했다. 홍신자는 한국을, 뉴욕을, 인도를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땅과 하나가 된 어느 무명 무용수의 발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자유롭기 위해 떠나야 하는 것은 장소나 사람이 아니라 ‘나’, 나의 에고라는 것을, 모든 구도는 ‘나’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버리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아마도 그 자유로운 발들은 자신을 버리기 위해 그토록 먼 길을 걸어야 했을 것이다. 한국에서 뉴욕으로 다시 인도로, 극장에서 산으로, 집에서 가게로. 사는 것은 평생 발이 닳도록 걷는 일. 누군가는 나를 비우고 오직 춤만을 남기기 위해, 그저 자연의 일부가 되기 위해,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걸음을 바치고, 나는 그런 걸음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도 발바닥이 뜨거워진다. 나도 그렇게 발이 닳도록 걷다 보면 내 안의 깊은 곳에 흐르는 용암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안 지겨워?”
엄마의 퇴근길을 함께 걸으며 물었다.
“여기가 내 인생의 순례길이야. 5분 순례길. 처음에는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다 없어졌어. 그냥 최선을 다해 사는 거야.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니.”
엄마는 뜨거운 발로 한결 가볍게 나아가며 말했다.
요즘 나는 엄마의 5분 순례길을 걸으며 아직도 굳건한 나의 에고에 대해 생각한다. 글을 쓰고 싶은 나, 쓰고 싶지 않은 나, 엄마의 딸인 나, 누구의 무엇이 되고 싶지 않은 나. 무엇이 되고 싶은 나, 아무것도 아닌 나. 나는 그 많은 나를 언제 비워낼 수 있을까…. 어쩌면 내게도 발바닥을 뜨겁게 달구는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 시간이 용암처럼 터지고 굳고 다시 흐르기를 반복하고 나면, 나는 없고 글과 삶이 남아, 수많은 생生이 만든 풍경 속의 작은 점이 될 수 있을까. 엄마가 찍은 점을 잇는 선이 될 수 있을까. 그 선은 또 어느 점으로 이어질까.
아직은 알 수 없다. 지금은 그냥 걸을 뿐이다. 구도자가 아닌 여행자의 마음으로. 여행자는 길을 묻는 사람이고, 홍신자는 사랑으로 가득한 자의 손가락은 언제나 정확한 곳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러니 이 무지한 걸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내가 길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생을 뜨겁게 만나기 위해 망설이지 않고 걸음을 내딛는 사람, 엄마. 맨발의 엄마가 내 앞에서 걷는다.
─✲─
신유진
엄마의 책장 앞을 서성이고, 파리의 오래된 극장을 돌아다니며 언어를 배우고 이야기를 꿈꿨다. 산문집 <창문 너머 어렴풋이>, <몽카페>, <열다섯 번의 낮>과 <열다섯 번의 밤>을 썼고, 아니 에르노의 <세월>, <진정한 장소>를 비롯한 여러 책을 옮겼다.


‘엄마의 책장으로부터’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월간소묘 : 레터]에 연재되었습니다. 더 풍성한 이야기들을 모으고 엮어 멀지 않은 때 책으로 찾아뵐게요.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건넌방 • 갈망 혹은 비명 • 맨발로 걷는다 • 나와 엄마와 마릴린 먼로 1 • 나와 엄마와 마릴린 먼로 2 • 첫눈 오던 날 • 별거 아닌 것들의 별것 • 사납게 써 내려간 글자들 • “다 그리고 싶어” -사랑을 연습한 시간 • 내가 집이 된 것만 같을 때 • 오렌지빛 하늘 아래 당신의 손을 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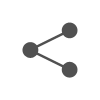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오렌지빛 하늘 아래 당신의 손을 잡고](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7/202406-엄마의책장-해안의여자들-450px-500x383.jpg)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내가 집이 된 것만 같을 때](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6/202405-고결쥐-캡처-590px-500x383.png)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다 그리고 싶어” -사랑을 연습한 시간](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5/202404-10manet_flowersinvase_1882-450px-500x383.jpeg)
![[엄마의 책장으로부터]사납게 써 내려간 글자들](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4/엄마의책장으로부터-202403-590px-500x383.jpg)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별거 아닌 것들의 별것](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1/202312-엄마의책장-그림-480px-500x38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