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신유진
나는 ‘여성의 텍스트’라 불리는 글들을 편애한다. 그런 글들은 기억이나 장소, 몸이나 질병, 하다못해 개를 이야기할 때도 언제나 여성의 이야기로 되돌아온다. 내가 여성이기에 동병상련의 입장으로 그런 책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서사가 더 특별하다 여겨서도 아니다. 그저 그런 이야기들이 글로 쓰이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할 뿐. 말로 다 하지 못한 것, 말에 갇힐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글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글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내가 아는 모든 여자는 자기만의 서사를 썼다. 밥 짓는 동안에, 어른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에, 시장에 가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동안에, 하다못해 마당에서 풀을 뽑는 동안에도 여자들은 자기 이야기를 했다. 혼잣말로, 수다로, 탄식으로. 그것으로도 다 할 수 없는 말들은 어딘가에 비밀스럽게 기록되었다.
김혜순 시인은 여성의 시 언어가 이제까지 밖에서 주어졌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반동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며, 여성의 언어는 본래 위반의 언어라고 했다.* 내가 아는 여성의 언어는 금을 내는 언어다. 다음에 오는 이를 위해 내가 지나온 길을 부수는 언어. 나의 여자들의 서사는 종종 “나처럼 살지 마라”로 시작됐다. 어느 어머니가 딸에게 “나처럼 살아라”고 말할 수 있었던가? 여자들은 그렇게 자기 부정을 통해 그들이 속한 세계를 위반했다. 각 가정에서 전해지는 여성 서사의 서문, “나처럼 살지 마라”의 본문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로 이어졌다.
아주 어릴 때, 엄마와 다른 삶을 사는 여성을 봤다. 엄마의 책장 맨 아래 칸을 차지했던 《라이프LIFE》 지에 실린 마릴린 먼로. 사진 속 마릴린 먼로는 기차에서 손을 흔들었고, 남자들은 예수 재림처럼 구원이라도 받으려는 듯 손을 뻗어 그녀를 만져보길 간절히 원했다. 일곱 살 여자아이에게 그녀는 남자들 머리 위에 있던 최초의 여성이었다. 식구들이 누워서 티브이를 보는 동안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던 엄마와는 다르게 굽 높은 하이힐을 신고 웃음을 흘리며 세상을 내려다보던 여자. 엄마는 그런 미소와 몸짓은 타고난 것이며,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마릴린 먼로에게는 있고 내게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 나는 내게 없는 것을 동경했다.
사춘기 시절 내게 이상적인 여성상은 오드리 헵번이었다. 물론 엄마의 영향이 컸다. 엄마는 종종 마릴린 먼로와 오드리 헵번을 비교하며 오드리 헵번이 가진 아름다움이야말로 진짜라고 말했으니까. 그녀가 아름다운 이유는 봉사에 바친 숭고한 삶이 컸지만, 그녀의 가는 허리와 자그마한 얼굴 역시 빼놓을 수 없었다. 한창 살이 찌던 십 대 시절, 엄마는 내게 다이어트를 요구하며 말했다. “오드리 헵번은 평생 샐러드만 먹었다더라. 모든 것에는 대가가 필요한 거야.” 그때 나는 샐러드 식단에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대가가 필요하다는 엄마의 말에 수긍했다. 티브이를 틀고, 잡지를 펼치면 대가를 치르고 아름다움을 획득한 여자들이 부러움을 샀다. 우리는 가슴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여성성을 말하진 않았지만, 플라스틱 인형처럼 마른 몸이 되는 희망 안에 우리의 여성성을 가뒀다. 유행하는 브랜드 옷가게에서는 66사이즈 이상의 옷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가 즐겨 보는 잡지에는 사과 다이어트, 포도 다이어트, 호박 다이어트 별별 다이어트 방법들이 소개됐다. 소위 뚱뚱하다고 놀림 받는 여자 코미디언이 오드리 헵번 흉내를 내면 상대역이 거북한 표정을 지었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웃었다. “살찐 여자는 게으른 거야”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고, 마른 몸을 칭송했고 부러워했다. 마릴린이 가슴을 더 내밀수록 열광하던 남자들과 허리가 더 가늘어지기를, 허벅지와 종아리가 얇아지기를 바랐던 우리가 무엇이 달랐을까. 마릴린과 우리는 그저 아름답게 보이고 싶었을 뿐이다. 타인의 눈에, 소비문화가 만든 여성성이라는 환상 속에.
성인이 되어 내가 처음으로 산 향수는 샤넬 n°5였고, 그 향수는 마릴린 먼로의 잠옷이라고 불렸다. 내가 그 향수를 뿌린다고 하면, “너도 그거 입고 자려고?”라고 물으며 이상한 눈빛으로 키득키득 웃는 남자애들이 있었다. 나는 멍청하게 웃는 그 애들에게 지기 싫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더 야한 농담을 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저질 농담과 싸웠다. 몰래 울거나, 농담보다 더 강해지거나, 침묵하거나. 우리는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 망할 세상에 절대 딸은 낳지 않겠다고. 엄마들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여성성을 부정하며 우리가 속한 세계를 위반하길 원했다.
마릴린 먼로 때문에 향수를 바꿀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 우아하다고 느꼈던 그 향기가 천박하게 느껴졌으니까. 그런데 무엇이, 왜 천박한가? 어떤 여자가 자기 침실에서 나체로 향수를 뿌리고 자는 것은 토끼가 그려진 수면 바지를 입고 자는 것과 뭐가 다른가? 다르다. 내가 그녀를 남성 판타지 안에서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 판타지를 경멸하면서 마릴린 먼로를 그 안에 가뒀기 때문이다. 레일라 슬리마니는 말했다. “여성들은 아주 일찍부터 남성의 프리즘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데 익숙해졌다. 우리는 이렇게 마릴린을 보고, 이 광경을 보는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나는 요즘도 샤넬 n°5를 뿌린다. 그 향기가 내 몸을 감쌀 때 라이프지 속의 마릴린과 남자애들의 유치한 농담과 그 농담에 상처받았던 나를 떠올리며 그 옛날 엄마의 책장으로 돌아가 외친다.
“엄마, 마릴린 먼로는 수첩에 글을 썼대. 종잇조각에, 냅킨에, 요리책에도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글을 썼대.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대. 더 나은 배우가 되고 싶어 했대. 엄마, 우리에게는 마릴린 먼로를 해방해줄 책이 필요해.”

마릴린(매릴린) 먼로, 1955 photo by Michael Chekhov
독자인 내게는 마릴린 먼로가 바람 부는 거리에서 치맛자락을 붙드는 이야기보다, 그녀가 종잇조각에, 냅킨에, 요리책에 썼던 글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누군가의 팬티 색깔이나 나체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진 내면의 색, 나체처럼 솔직한 언어가 궁금하다. 그렇다면 작가로서 나는 어떠한가? 그런 물음이 내 안에 찾아올 때면, 제대로 된 여성 서사를 말한 적 없음이 부끄러워진다. 솔직해지자. 모르기 때문이다. 여성 서사를 다룬 책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것은 타인의 지식이나 사유, 배움을 향한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나라는 여성, 시몬 베유도 실비아 플라스도 리베카 솔닛도 말할 수 없는 나라는 여성의 서사다. 그 미지의 세계는 내 몸과 기억 속에 여전히 잠형 중이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해야 하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글을 쓰려고 하는 것은 그 세계를 꺼내보려는 시도가 아닐까. 슬리마니는 “문학은 현실을 재구성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부분을, 빠진 것을 채우는 데 쓰인다. 파내고, 그와 동시에 또 다른 현실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 꾸며내는 것이 아니다. 상상하고 추억과 영원한 강박의 조각들을 서로 이어 구성한 하나의 시각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엄마의 책장 마지막 칸은 텅 비었다. 《라이프》 지는 오래전에 버려졌다. 엄마는 더 이상 어떤 여배우의 몸짓이나 향수, 몸매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나 역시 다르지 않다. 이제 우리에게 마릴린 먼로는 빈칸이 됐다. 우리는 어떤 책으로, 어떤 이야기로 그 칸을 채워야 할까? 내가 아는 것은 덮거나 가리면서가 아니라 털어내면서, 없음을 드러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나의 무지를 해부대에 올릴 필요가 있다. 가르고 찢어서 내가 발견한 진실에 하나씩 꿰매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면 어떨까?
나는 샤넬 N°5를 쓰지만 잠옷의 용도는 아니다. 내 잠옷을 당신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나는 가는 허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먹는다(정확히 곁들여 먹는다). 나는 마릴린 먼로를 잘 모르지만, 최근에 그녀가 강박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기록이 책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아는 여자들처럼 그녀도 써야 했을 것이다. 말로 다 하지 못한 것, 말에 갇힌 것들을. 그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면 무엇을 써야 한단 말인가? 나는 엄마가 금을 낸 그 여성의 세계에서 벗어나 내가 살아갈 땅을 찾는 중이다. 나의 땅은 여성 명사이고, 나는 그 땅 안에서 쓴다. 내가 틀린 것을, 모르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을. 그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면 무엇을 써야 한단 말인가?
─✲─
신유진
엄마의 책장 앞을 서성이고, 파리의 오래된 극장을 돌아다니며 언어를 배우고 이야기를 꿈꿨다. 산문집 <창문 너머 어렴풋이>, <몽카페>, <열다섯 번의 낮>과 <열다섯 번의 밤>을 썼고, 아니 에르노의 <세월>, <진정한 장소>를 비롯한 여러 책을 옮겼다.


‘엄마의 책장으로부터’는 [월간소묘 : 레터]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건넌방 • 갈망 혹은 비명 • 맨발로 걷는다 • 나와 엄마와 마릴린 먼로 1 • 나와 엄마와 마릴린 먼로 2 • 첫눈 오던 날 • 별거 아닌 것들의 별것 • 사납게 써 내려간 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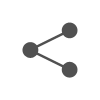
![[엄마의 책장으로부터]사납게 써 내려간 글자들](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4/엄마의책장으로부터-202403-590px-500x383.jpg)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별거 아닌 것들의 별것](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1/202312-엄마의책장-그림-480px-500x383.jpeg)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첫눈 오던 날](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12/엄마의책장-202311-630px-500x383.jpg)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나와 엄마와 마릴린 먼로 2](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11/시몬베유_1974-630px-500x383.webp)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맨발로 걷는다](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09/isadora_duncan_arnold_genthe-680px-500x3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