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신유진
소바주sauvage, ‘야생의, 거친’이란 뜻을 담은 이 단어는 여전히 남성성을 상징할까? 티브이를 보다가 조니 뎁과 눈이 마주친 순간 궁금해졌다. 사막에서 조니 뎁이 기타를 거칠게 연주하자 늑대들이 깨어난다. 늑대들은 조니 뎁과 나란히 걷는다. 남성용 향수, 소바주 광고의 한 장면이다. 소바주의 향기란 뭘까? 늑대 냄새? 남자 냄새? 내게는 어려운 클리셰다. 나의 소바주에는 조니 뎁과 늑대가 없다. 내게 행운처럼 찾아왔던 몇 권의 책들이 남긴 위업이다. 클리셰를 거부하기, 클리셰에 질문하기, 클리셰를 지우기. 지운 자리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다시 써 본다. 오직 연필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옛 유행가가 있는데,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연필로 써야 한단다. 내가 믿는 진실도 그렇다. 언젠가는 고쳐지고 지워져야 한다. 연필로 쓴 나의 진실은 유약하고 불완전하나 자유롭다. 박제되길, 문장 안에 갇히길 거부한다. 근육이나 타투는 없지만 자잘한 상처는 있다. 그 진실은 사막보다 더 큰 위험이 도사리는 글자의 세계에서 늑대보다 더 사나운 자기 비하와 자기 위안 그보다 더 무서운 비대한 자아를 경계하며 나아간다. 나의 이 연약한 진실에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 또한 소바주가 아닐까.
클리셰를 지운 자리에 소바주를 다시 써본다.
나의 첫 번째 소바주는 글자들이었다. 어느 오후, 엄마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유리 탁자 위에 맨발을 올리고, 수화기를 들고 중얼거리며 전단지나 전화번호부, 메모지에 반복적으로 적었던, 언뜻 보면 무의미한 것 같으나 자세히 보면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는 말들을 담았던 글자들.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짙어지는 볼펜의 두께, 네모 칸, 네모 칸 속 또 다른 네모 칸, 힘을 주어 그린 빗금이 지운 말들. 무엇이었을까? 긴박하게 또는 사납게 적어 내려간 그 단어들은.
엄마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화기를 다시 내려놓고, 발을 올렸던 유리 탁자를 마른걸레로 훔치고, 각을 맞춰 정리한 물건들 사이에 낙서를 숨기고 떠나면, 나는 그 자리에 엄마처럼 비스듬히 앉아 숨겨진 것들을 들춰냈다. 전화번호 모서리에 적힌 ‘갈치속젓’, 전단지에 빗금으로 지운 ‘생활비’ 그리고 ‘글 쓰는 여자’, 네모 칸을 그린 후에 그 안에 가둔 ‘삶’이라는 글자, 또 몇 번이나 고쳐 쓴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문장. 나는 그 글자들의 조련사가 되고 싶었다. 비린내 나는 글자는 깨끗이 씻기고, 내가 모르는 어떤 의미들을 해독하고, 조련하고, 길들이고 싶었다. 길들여진 것만이 세상에 나올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사람들이 길들이지 않은 것을 꼭꼭 감추고 살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 글자들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말, 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는 말, 더 넓고, 크고, 위험한 세상을 향해 튀어 나갈 듯이 웅크리고 있는 말. 나는 때때로 그 야생의 글자들을 비린내와 싸구려 볼펜 잉크 냄새를 벗겨 ‘진실’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나의 문장으로 만들곤 했다. 나는 자주 엄마의 단어를, 문장을 훔쳐 썼다.
‘여성의 텍스트란 무엇일까요?’
어느 서가 앞에서 질문을 받았고 나는 진실이라 믿는 것들을 말했다. 여성이 받아온 사회적 제약과 제한, 모성, 쓰고자 하는 욕망. 결국 쓸 수밖에 없는 운명 등등.
“빠진 게 있어요.”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질문자가 말했다. 잠시 적막이 흘렀다.
“야성이요. 여성이 가진 야성이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의 침묵을, 내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때렸다. 내게도 야성이라 부를 수 있는 게 있을까. 한 번도 표출해 본 적 없는, 그러나 전화번호부, 전단지, 속 야생의 단어들을 보며 막연히 짐작해 본 ‘야성’. 그날 이후 그 말이 나를 사로잡았다. 내게 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 단어가 이토록 나를 사로잡은 것은 어떤 진실을 고쳐 쓰기 위함은 아닐까?

아나 멘디에타, ‘모래여자’ 시리즈, 1983.
갈치속젓, 생활비, 글 쓰는 여자, 삶, 잘못된 건 아닐까.
나는 이 글자들을 해부하기 위해 하얀 화면 위에 올려놓는다. 칼을 대기도 전에 시뻘건 심장처럼 박동하는 것들이 있다. 살아가려는 각오와 살아남으려는 의지 같은 것. 가벼우면서도 진한 그 글자들은 중심부와 주변부를 나눌 수 없고, 흩어진 채로 한 여성의 세계를 구성할 뿐이다.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 탄생한, 청중도 독자도 없는 말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여성의 텍스트들이 감춰져 있을까. 나는 그 말들의 조련사가 아니라 조력자가 되어야 했다. 네모 칸 안의 네모 칸, 그 속에 들어가 볼펜으로 그은 빗금을 거둬내고 그 말들을 해방해야 했다. 나는 말들의 목격자가 되어야 했다. 그것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한 여성의 삶을, 그 삶의 의미를 묻고 따지고 외치는지 증언해야 했다. 나는 그 말들을 절실하게 쫓되 개입하지 않는, 겸손한 추적자가 돼야 했다. 나는 한 여성의 야성을 길들이려는 힘에 저항하고, 그 야성에 목소리를 부여하는 일에 동참해야 했다. 수십 년 전에 양파껍질과 코를 푼 화장지, 어린이용 스케치북, 플라스틱 봉지, 생선 내장들과 함께 버려진 그 글자들의 주인에게 말해야 했다.
흩어진 말을 모아봐, 문법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마, 문학적 표현도 필요 없어. 비린내 나는 말도, 푼돈 냄새 나는 말도 아름다워. 틀린 것을 드러내봐. 틀린 것으로 하나뿐인 정답을 만들어봐, 엄마만의 글을 써줘. 내가 독자가 될게.
어쩌면 엄마는 내가 쓸 수 없는 글을 쓰지 않았을까. 종이 위에 얌전히 누운 글자가 아닌, 야생마처럼 거침없이 달리는 글, 야성이 깨어 있는 여성의 글.
그러나 쓰레기통으로 사라진 그 말들은 이제 이곳에 없다. 나는 더 이상 조력자나 목격자나 추적자가 될 수 없다. 이제 내게 남은 기회는 딱 하나다. 복원사가 되는 것.
내가 이곳에 옮겨 적은 ‘갈치속젓, 생활비, 글 쓰는 여자, 삶,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말은 오래전 엄마가 전화번호부나 전단지에 썼던 말들과 결코 같을 수 없다. 수많은 말들 중에 내가 선택한 단어들만 나열된다는 것만으로도 내 시선의 개입을 의미하니까. 그때 엄마의 말이 품은 순수한 야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복원에는 두 번째 시간을 산다는 의미가 있다. 엄마가 쓴 글을 내가 두 번째로 살아볼 기회 말이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두 번째 시간을 살기 위해서다.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놓쳤던 타인의 말을 다시 살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정신분석학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저 말을 담는 사람, 담은 말에 음표와 쉼표를 그리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것은 내가 놓친 것들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오늘 내가 연필로 쓴 진실은 한 여성의 야성이다. 물론 이 진실은 굶주린 늑대와 함께 사막을 장악하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사막의 모래가 되길 원할 뿐. 고치고 지우고, 깎고 닳아져 사막에 펼쳐진 모래 한 알이 되기를 바란다. 최소 단위의 사막, 그러나 사막의 본질일 수밖에 없는 모래알을 꿈꾼다. 나의 그 사막에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은 소바주가 아닐까? 어떤 향이 날까? 유리병이 아닌 종잇장에 담긴 나의 진실, 이 소바주의 향기는.
─✲─
신유진
엄마의 책장 앞을 서성이고, 파리의 오래된 극장을 돌아다니며 언어를 배우고 이야기를 꿈꿨다. 산문집 <창문 너머 어렴풋이>, <몽카페>, <열다섯 번의 낮>과 <열다섯 번의 밤>을 썼고, 아니 에르노의 <세월>, <진정한 장소>를 비롯한 여러 책을 옮겼다.


‘엄마의 책장으로부터’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월간소묘 : 레터]에 연재되었습니다. 더 풍성한 이야기들을 모으고 엮어 멀지 않은 때 책으로 찾아뵐게요.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건넌방 • 갈망 혹은 비명 • 맨발로 걷는다 • 나와 엄마와 마릴린 먼로 1 • 나와 엄마와 마릴린 먼로 2 • 첫눈 오던 날 • 별거 아닌 것들의 별것 • 사납게 써 내려간 글자들 • “다 그리고 싶어” -사랑을 연습한 시간 • 내가 집이 된 것만 같을 때 • 오렌지빛 하늘 아래 당신의 손을 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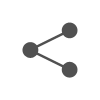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오렌지빛 하늘 아래 당신의 손을 잡고](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7/202406-엄마의책장-해안의여자들-450px-500x383.jpg)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내가 집이 된 것만 같을 때](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6/202405-고결쥐-캡처-590px-500x383.png)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다 그리고 싶어” -사랑을 연습한 시간](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5/202404-10manet_flowersinvase_1882-450px-500x383.jpeg)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별거 아닌 것들의 별것](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1/202312-엄마의책장-그림-480px-500x383.jpeg)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첫눈 오던 날](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12/엄마의책장-202311-630px-500x3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