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한샘
어렸을 때 압정을 밟은 적이 있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 시절에는 압정이 어디에나 있었다. 당시 압정은 요즘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모양이 아니고 납작한 모양 딱 하나여서, 바닥에 떨어지면 대부분의 경우 무섭고 뾰족한 바늘을 위로 하고 놓일 수밖에 없는 모양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압정을 밟지 않으려고 고개를 빼고 조심하며 걸었다. 압정을 밟는 것은, 그것이 발바닥에 박히는 것은 당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고 으으윽 하는 신음이 절로 나왔다. 그러니까 나는 그 상상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아이였다. 압정을 밟은 그날, 그것을 밟는 순간 내 몸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발바닥의 뒤꿈치 쪽이 뚫리는 선명한 느낌이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몸을 타고 올라올 때 나는 분명히 들었다. 봉제 인형에게 옷을 입혀준답시고 대충 천을 댄 채로 바늘을 이리저리 옮겨보다 솜이 빵빵한 배를 찔렀을 때 나던 ‘푹’ 소리와 매우 흡사한 그 소리를.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다. 내 손으로는 절대 이것을 빼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게다가 생각보다 두꺼운) 것이 몸에 박혀 있다니. 그것을 밟지 않으려 얼마나 조심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버린 것이다. 심장이 몸 밖에서 뛰는 것처럼 쿵쿵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대로 주저앉아 다리를 붙잡고 소리를 치며 우니 엄마가 뛰어왔다. 엄마가 내린 처방은 매우 공포스러운 것이었는데 망치로 뒤꿈치를 두드리는 것이었다. 망치로 압정이 박혀 있는 바로 그 옆을 통통통 두드리면 압정이 튀어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 흉측한 것이 몸에 박혀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포가 극에 달했는데 망치로 옆을 친다니, 나는 그런 방법이 통할 리가 없다고 소리를 질렀다. 못을 박을 때나 쓰는 것으로 생각한 무시무시한 도구로 그 옆을 통통통 두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다. 그냥 빼달라고 하니 엄마는 확 빼면 피가 나고 오히려 안 좋다는 말을 했던 것 같다. 뭐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의 힘은 나보다 강했고, 버둥대던 나는 결국 무력하게 발을 내준 채로 마룻바닥에 붙어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흑흑 울었다. 엄마는 망치로 정말 압정 옆을 통통통 두드리기 시작했고 망치로 두드린다고 압정이 나올 리 없다고 생각하며 울던 내게도 규칙적인 통통통 소리는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게다가 별로 아프지도 않았다. 어리둥절한 마음에 울음소리가 억지가 되어갈 때쯤 엄마가 눈앞에 압정을 들이밀었다. 자 봐, 나왔잖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기억은 어린 시절의 제법 선명한 기억 중 하나로 남아있다. 문득 궁금해져서 ‘발바닥에 압정 박혔을 때’, ‘압정 빼는 법’ 등을 아무리 검색해도 박힌 압정 옆을 통통통 치라는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 엄마에게 압정을 그렇게 빼준 적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서도 그게 무슨 민간요법이었을 텐데? 하신다. 그렇게 빼면 파상풍 위험이 있었을 텐데…라는 말도 함께. 엄마의 자신 없는 목소리에 한층 신뢰를 잃은 내 기억을 이번에는 언니에게 묻는다. 언니 역시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선명하게 생각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니만, 엄마는 여러 분야에서 종종 자기만의 방식을 썼었지. 라고 말한다. 그 말이 압정의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소환한다. 아, 엄마는 엄마만의 방법이 있는 사람이었지. 엄마만의 압정을 빼는 방법, 엄마만의 옷을 만드는 방법, 엄마만의 비타민을 먹이는 방법.
엄마가 책을 좀 찾아달라고 한다. “파란 책인데… 지난달에 네 책상에 있어서 좀 읽어볼까 했거든? 그런데 몇 장 읽어보니 그땐 도저히 못 읽겠어서 덮었는데 어제가 딱 넉 달 되는 날이었잖아.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읽어볼까 해. 알아서 찾아 읽으려 했는데, 없더라.”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그렇게 툭 건넨 말이었다. 바로 앞에 앉아 있지만 눈이라도 마주치면 큰일 날 것처럼 어깨 너머로 시선을 고정한 채. 엄마가 말한 책은 내가 아빠의 죽음 이후 비애의 공간으로 들어가 누워버렸던 바로 그 책, 조앤 디디온의 《상실》이었다. 내게 애도의 글을 찾아 읽고 싶다는 마음이 찾아오기까지 걸린 시간 4주. 엄마가 엄마에게는 낯설기만 한 이름의 작가가 쓴 남편의 죽음 이후의 글을 읽을 마음이 드는 데까지 걸린 시간 넉 달. 우리는 시간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다.

같은 방향이어도 시간의 차이가 있으며 아빠를 잃은 나의 애도와 남편을 잃은 엄마의 애도는 그 모습도 나타나는 방식도 당연히 다르기에 엄마의 마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아빠 없이 맞이한 첫 어버이날에 엄마에게 선물한 빨간 운동화는 결국 회색으로 바뀌어 신발장에 들어갔다.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빨간색이었기에 좋아하기에 골랐던 신발이었다.
적어도 일 년은 빨간색을 안 하려고 해.
빨간색이 왜?
그냥… 빨간색은 좀 그렇잖아.
누구보다도 빨간색을 좋아하던 엄마에게 빨간색은 좀 그런 색이 되었구나. 엄마는 빨간색을 ‘하는’ 마음이 무엇이라 생각하는 걸까. 빨간색을 하면 애도의 마음이 사라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치 덜 슬픈 사람만이 빨간색을 하는 것처럼 엄마는 그렇게 말했다.
엄마의 마음에 나는 알 수 없는 모양으로 어쩔 도리 없이 박혀 있는 그 압정을 빼주고 싶다. 내가 글과 책으로 도피해 나만의 애도의 벽을 쌓는 동안 엄마는 스스로 압정을 빼지 못해 빨간색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나. 한 번에 빼줄 수도, 빼는 방법도 모르니 그 옆을 통통통 두드리기라도 하고 싶다. 두드릴 때마다 피하고자 하는 것들에 문을 열어주기. 통. 떠난 남편을 애도하며 쓴 책을 읽어도 괜찮다고, 통. 빨간 운동화를 신어도 괜찮다고, 통. 재밌는 영화를 보고 웃어도 괜찮다고, 통,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 진짜 괜찮다고.
엄마가 엄마만의 방법으로 내 뒤꿈치에 박힌 압정을 빼줬던 것처럼 나도 엄마의 마음에 박힌 압정을 빼주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고 싶다. 그 방법을 찾으며 엄마의 마음을 돌보다 보면 내 마음에 박힌 압정도 통통통 빠져나갈 것이라 믿기에. 통. 엄마에게 책을 찾아주며, 통. 같은 책을 읽으며, 통. 서로가 친 밑줄을 살피며. 그렇게 통통통.
─✲─
정한샘
2020년 7월 31일 가정식 책방 ‘리브레리아Q’를 열었다. 이탈리아에서 음악을 공부했고, 지금은 책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딸과 나눈 책 편지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는 마주 앉아》를 썼고, 그림책 《구름의 나날》을 옮겼다.
_리브레리아Q @libreriaq


‘가정식 책방: 리브레리아Q 서점원 노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월간소묘 : 레터]에 연재되었습니다. 더 풍성한 이야기들을 모으고 엮어 멀지 않은 때 책으로 찾아뵐게요.
[가정식 책방: 리브레리아Q 서점원 노트]
여긴 뭐하는 곳인가요? • 기다리는 일 • 밤과 밤 • 오늘은 대목 • 작은 일렁임이 파도가 될 때까지 • 서점원Q가 보내는 11월의 편지 • 보이지 않는 곳에서 • 기뻤어, 기뻤어, 기뻤어 • 4월의 책을 보내는 마음 • 누군가에게 집이 되어주고 싶어서 • 압정 빼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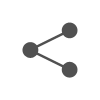
![[가정식 책방] 누군가에게 집이 되어주고 싶어서](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6/202405-042-590px-500x383.jpg)
![[가정식 책방] 4월의 책을 보내는 마음](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5/202404-so01-2.JPG-590px-500x383.jpg)
![[가정식 책방] 기뻤어, 기뻤어, 기뻤어](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4/가정식책방-202403.JPG-590px-500x383.jpg)
![[가정식 책방] 보이지 않는 곳에서](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1/202312-가정식책방-그림-연극소프루의-한-장면-_국립극장.jpg-580px-500x383.jpeg)
![[가정식 책방] 서점원Q가 보내는 11월의 편지](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12/가정식책방-202311-02-590px-500x3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