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한샘
어렸을 때 엄마는 자주 밤을 삶았다. 이 작업은 주로 해가 진 후 방 안에서 이루어졌다. 삶은 밤의 두꺼운 겉껍질을 까는 건 나와 언니의 몫이었다. 푹 삶은 밤의 겉껍질은 두껍긴 해도 전혀 딱딱하지 않아, 갈라져 있는 뾰족한 끝을 잡고 엄마가 미리 내어둔 칼집 방향을 따라 아래로 죽 당기면 쉽게 벗겨졌다. 벗긴 밤을 엄마 앞에 놓인 나무 도마 위에 쌓아 놓으면 엄마는 작은 칼로 속껍질을 벗겨 양푼에 담았다. 양푼 안에 밤이 수북하게 모이면 숟가락을 세워 밤을 써는 것처럼 부순 후 꾹꾹 눌러 으깨는 작업이 이어진다. 엄마가 밤을 부수고 으깨는 동안 언니와 나는 바닥에 떨어진 껍질들을 손바닥으로 쓸어 한곳으로 모으며 엄마를 돕는 시늉을 했다. 노란 플라스틱 뚜껑을 돌려 꿀통을 열고 끝이 눌어붙은 빨간 플라스틱 국자로 꿀을 퍼서 으깬 밤 위로 붓던 엄마. 국자에서 매끄럽게 떨어지던 꿀이 방울방울이 되면 검지로 국자 밑을 슥 훑어 밤 위에 묻히던 엄마. 찐득해진 밤을 국자 뒤로 다독인 후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으며 묘한 미소를 짓던 엄마의 얼굴이 기억난다. 그리고 양푼에 남아 있는 밤을 퍼먹던 밤.
오랜 시간이 지났다. 화장실이 주인집 마당에 있던 단층 주택의 방 한 칸을 빌려 살던 유년의 기억은 중간중간이 삭제되고 희미해져 ‘가난한 시절’로 뭉뚱그려졌다. 하지만 꿀에 잰 밤처럼 선명한 기억 몇 조각은, 마구 뒤섞인 유년 시절의 퍼즐을 맞춰주는 그런 조각은 예상치 않은 순간에 불현듯 찾아온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그때의 밤과는 맛도 모양도 전혀 다른, 방부제 향인지 무엇인지 모를 인공적인 향마저 나는 밤을 사서 먹다가 갑자기 울컥하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다. 편의점에서 혼자 밤을 먹으며 우는 건 완전 사연 많은 사람 같아 보일 것 같다고 생각하며 사이다를 사서 벌컥벌컥 마신다. 어떤 기억은 그렇게 목이 메게 찾아오곤 한다.

처음 밤을 받고 내가 밤을 좋아한다고 말했던가. 와아 밤이에요? 저 밤 좋아해요, 라고 말한 것 같기도 하다. 단골손님이 건네신 봉지 안에는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밤들이 한가득 들어 있었다. 밤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얼른 집에 가서 삶고 으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음식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날 밤, 삶은 밤에 이제는 먹지 않는 꿀 대신 아가베 시럽을 잔뜩 넣어 슥슥 비비고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 식탁에 앉아 비빈 통에 남아 있는 밤을 긁어 먹는데 편의점에 서서 밤을 먹었을 때처럼 눈물이 났다.
밤이라는 것이 원래 집에 들이면 계속 생각이 나게 마련인 건지, 밤을 처음 사본 나는 틈만 나면 밤을 생각했다. 글을 쓰다가도, 냉장고 문을 열다가도 불쑥불쑥 떠올라서 베란다에 나가 밤송이들이 잘 있나 확인했다. 나간 김에 창가에 붙어 서서 바람을 맞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러는 동안 가을을 곱씹었다. 내가 밤을 생각할 때마다 가을도 쫓아와서 내 곁을 기웃거렸다. 실수로 산 밤 한 바구니 때문에 나는 온종일 밤과 가을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사람이 된 것이 기뻤다. 어처구니없게도 잘 살고 있다는 기분마저 들었다.
_문이영, 〈우울이라 쓰지 않고〉
밤은 작은 방에서의 다른 기억들도 데리고 온다. 가장 최근에 데려온 기억은 방석이었다. 밤의 속껍질을 까는 엄마는 노란 장판의 방바닥 위에 그대로 앉아 있고, 방석은 언니와 나의 엉덩이 아래에만 깔려 있다. 예전 앨범 속에서 그 방석을 본 적이 있다. 언니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진이었는데 방석은 케이크 아래, 다리가 접히는 동그란 밥상 위에 깔려 있었다. 방석이 테이블보도 되던 그런 시절이었구나. 케이크 아래 무언가를 깔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다 실패한다. 밤과 함께 도착한 기억을 눈으로 확인하려 본가에 가 사진을 찾았더니 엄마는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나 쳐다보기도 싫어 예전 사진을 다 버렸다고 했다. 나는 내 기억이기도 한 사진들을 상의 없이 버린 엄마에게 던질 원망의 말을 찾다가 문득 그때의 엄마가 서른 살쯤이었다는 것에 마음이 서늘해진다.
그 밤에 엄마 얼굴에 어렸던 미소는 아마도 어린 딸들을 위한 며칠간의 간식이 준비되었기에 나온 표정이었을 것이다. 미소가 묘하게 슬퍼 보였던 건 그런 잠시의 다정함으로 포장하기에는 가난한 생활의 무게가 너무 버거웠기 때문이었으리라. 버거운 밤은 그 시절의 사진을 볼 때마다 엄마를 찾아왔을지도 모르겠다. 나의 밤과 엄마의 밤은 많이 달랐을 것이기에, 사진에 담긴 엄마의 기억과 내 기억 또한 다를 것이기에 사진을 버린 엄마에게 나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괜찮다. 밤과 함께 도착한 내가 잃어버렸던 퍼즐 한 조각은 마음속 앨범에 조용히 담긴다.
첫 밤 이후 밤은 계속 도착하고 있다. 어느 날은 생산자의 이름으로 직배송된 밤이 상자째 도착한다. 저희 집 거 사면서 같이 주문했어요. 맛이 있어야 할 텐데요. 문자도 이어서 도착한다. 계속 주시는 걸 보니 아무래도 처음에 밤을 좋아한다고 말했었나 보다. 이번에는 알이 좀 작습니다, 이번 밤은 안 단 것 같아요, 라는 설명을 달고 올 때도 있다. 각기 다른 맛과 모양의 밤이 무심하게 책방 앞에 툭, 놓인다.
그 손님은 내게 무엇을 주고 계신지 모를 것이다. 밤과 밤이 함께 오는 줄 모르고 그저 밤을 주었다 생각하시겠지.
─✲─
정한샘
2020년 7월 31일 가정식 책방 ‘리브레리아Q’를 열었다. 이탈리아에서 음악을 공부했고, 지금은 책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딸과 나눈 책 편지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는 마주 앉아》를 썼고, 그림책 《구름의 나날》을 옮겼다.
_리브레리아Q @libreriaq


‘가정식 책방: 리브레리아Q 서점원 노트’는 [월간소묘 : 레터]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가정식 책방: 리브레리아Q 서점원 노트]
여긴 뭐하는 곳인가요? • 기다리는 일 • 밤과 밤 • 오늘은 대목 • 작은 일렁임이 파도가 될 때까지 • 서점원Q가 보내는 11월의 편지 • 보이지 않는 곳에서 • 기뻤어, 기뻤어, 기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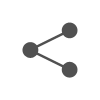
![[가정식 책방] 기뻤어, 기뻤어, 기뻤어](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4/가정식책방-202403.JPG-590px-500x383.jpg)
![[가정식 책방] 보이지 않는 곳에서](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1/202312-가정식책방-그림-연극소프루의-한-장면-_국립극장.jpg-580px-500x383.jpeg)
![[가정식 책방] 서점원Q가 보내는 11월의 편지](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12/가정식책방-202311-02-590px-500x383.jpg)
![[가정식 책방] 작은 일렁임이 파도가 될 때까지](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11/202310-630px-500x383.jpg)
![[가정식 책방] 오늘은 대목](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10/11-630px-500x3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