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한샘
어두운 공간을 목소리가 채운다. 단어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꽂혀 와 숨을 쉴 타이밍을 자꾸 놓친다. 이어지는 첼로와 기타의 선율에 참았던 숨을 뱉는다. 낭독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 하는 이 시간을 위해 책방 문을 닫자마자 고속도로를 달렸다. 낭독이 이루어질 책은 포르투갈의 극작가이자 연극 연출가인 티아구 호드리게스가 쓴 희곡집 《소프루》이고 그에 맞는 음악을 첼로와 클래식 기타가 연주해 줄 것이었다. 《소프루》는 무대 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우에게 대사와 동선을 알려주는 ‘프롬프터’를 주인공으로 이끌어낸 희곡집이다. ‘소프루’라는 단어는 포르투갈어로 ‘숨’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불어넣어져야만 살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그것이 목소리와 악기를 통해 내게 전달되고 있다. 검은 박스 안에 존재했던 이의 마음이 목소리를 타고 나오니, 마치 노래 같기도 하다.
퇴근 차량이 몰리는 시간과 겹쳤기에 시작 시간을 겨우 맞출 수 있었다. 뒤쪽에 남아 있는 자리에 앉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낭독자와 연주자들이 앉아 있는 사람들 사이로 입장했다. 그리고 바로 공연이 시작되었다. 객석과 그들의 거리가 너무나도 가까워서 앞줄에 앉은 이들은 그들의 숨소리까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 긴장감을 온몸으로, 몸에 남아 있는 기억으로 느꼈다.
바이올린을 처음 잡은 건 아홉 살 때였다. 엄마가 내린 결정에 따라 방과 후 수업으로 바이올린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나보다 두 해 앞서 바이올린반에 들어갔던 언니가 영어회화반으로 옮기게 되었으니 언니가 사용하던 바이올린을 내가 써야만 한다고 했다. 나는 소설가나 무용가가 되고 싶었는데 엄마는 책을 읽는 일도, 춤을 추는 일도 나중에 하라고 했다. 그렇게 얼떨결에 시작한 바이올린이지만 받아들이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연습을 하지 않아도 다른 아이들 정도는 할 수 있었다. 개인교습을 받는 아이들을 제치고 상을 받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재능이라 말했다. 그냥 두기에 아깝다고도 했다. 시간이 지나고 가정의 경제 상황에 따라 배우는 공간과 형태도 바뀌기 시작했다. 방과 후 교실에서 동네 학원으로, 그다음에는 집으로 찾아오는 선생님으로, 그리고 열다섯 살부터는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 개인지도를 받게 되었다. 엄마의 열정이 강해진 그때쯤 내게도 흥미가 조금 생겨서 어쩌면 앞으로 바이올린 연주자로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낭독과 연주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 첼로 연주자는 프롬프터라는 직업에 빗대어 질문한다.
무대 아래의 삶, 보이지 않는 삶이 행복할까요? 그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제일 뒷줄에 앉아 그에게는 한 덩이 어둠으로만 보일 공간에서 나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인다. 보이지 않기를 택하는 사람, 무대 아래의 삶이 어쩌면 더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 그게 나이기 때문이다.

연극 〈소프루〉의 한 장면(국립극장)
무대 위가 너무 무서웠다. 연주자 머리 위로 동그랗게 떨어지는 핀 조명 안으로 들어가 설 때마다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는 상상을 했다. 나의 떨림이 느껴지지 않도록 활을 현 위에 올리고 자연스럽게 첫 음을 내는 그 순간까지가 나에게는 지옥이었다. 무대 위에서는 다른 시간이 흘렀다. 무대에서 내려오며 가장 많이 한 말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였다. 조명에 녹아버리지 않으려 두 다리에 힘을 줘야 하는 시간이 싫었고, 바이올린이 싫어졌다.
그러다 우연히 교수님의 소개로 오페라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오페라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자리는 마치 프롬프터가 무대 위에서 몸을 숨긴 박스처럼 무대 아래, 배우들의 발아래에 있었다. 구멍처럼 뚫린 어두운 공간으로 통하는 계단을 밟으며 마음이 편해졌다. 내리쬐는 조명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다. 내게 허락된 조명은 오로지 나의 보면대만을 비추는 작은 스탠드뿐이었다. 빛이 없으므로 주인공이 아니었고, 관객들 눈에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연주가 쉬어갈 때는 무대 위를 곁눈질하며 저들의 연기가 틀리지 않기를 바랐다. 그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니 처음으로 연주가 재미있었다. 이후 교수님이 뮤지컬이나 오페라 세션이 필요하다 하시면 무조건 하겠다고 했다. 이곳이라면 어쩌면 연주를 계속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므로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질문을 던진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책을 골라 책방을 채우는 서점원의 일이 꼭 무대 아래의 일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검은 박스 안에 몸을 숨긴 프롬프터 같다는 생각도. 무대 아래에서 새어 나오는 음악이 있어야만 공연이 완성되었지만, 빛은 무대 위 배우만을 비추고 있기에 관객은 그 존재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끝나버린 공연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빛이 있는 곳에서 어둠을 담당한다는 점이 근사하게 느껴졌다. 그게 좋았기에 반주자들에게 공을 돌리는 시간이 오히려 조금 민망했다. 책방에서 빛을 받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책이다. 책은 책방에서 유일한 주인공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곳에 놓여야 한다. 그 적절한 자리를 찾는 것이 나의 일이다. 어느 날 문득 그 존재를 알아차리고 이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며 놀라는 이에게 공감하며 박수 쳐주는 일도, 오래 자리를 지킨 책의 먼지를 털어주는 일도 마찬가지다. 책을 발견한 이는 책을 쓴 이를 떠올릴 것이고, 세심한 사람이라면 어쩌면 책을 만든 이들까지도 생각해 줄지 모른다. 책을 진열하고 파는 이는 아마도 책이라는 주인공 뒤에서 가장 끝자리에 존재하지 않을까.
책방에 있는 그 어떤 책에도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어요, 라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다. 이제는 그 손길에 내 숨도 닿아 있다는 생각을 한다. 가끔 이곳이 책방의 기능을 다하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다. 손님이 계속 줄어들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 텐데 나는 과연 이 공간을 채운 책들을 다 치워버릴 수 있을까. 책이 빠져나간 공간에 텅 빈 숨만 남게 되는 것을 상상하면 조금 슬퍼진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으니, 아무도 내 노동을 몰라줘도 좋으니 책이 빛나는 공간이 오래 지속되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 책들이 알아서 자리를 잡고 놓여 있다고 생각해도 좋으니 말이다.
소프루. 나의 숨, 나의 호흡이 차 있는 책방. 또다시 연말을 맞이한 4년 차 서점원의 마음은 이렇게나 비장하다.
─✲─
정한샘
2020년 7월 31일 가정식 책방 ‘리브레리아Q’를 열었다. 이탈리아에서 음악을 공부했고, 지금은 책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딸과 나눈 책 편지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는 마주 앉아》를 썼고, 그림책 《구름의 나날》을 옮겼다.
_리브레리아Q @libreriaq


‘가정식 책방: 리브레리아Q 서점원 노트’는 [월간소묘 : 레터]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가정식 책방: 리브레리아Q 서점원 노트]
여긴 뭐하는 곳인가요? • 기다리는 일 • 밤과 밤 • 오늘은 대목 • 작은 일렁임이 파도가 될 때까지 • 서점원Q가 보내는 11월의 편지 • 보이지 않는 곳에서 • 기뻤어, 기뻤어, 기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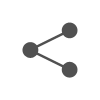
![[가정식 책방] 기뻤어, 기뻤어, 기뻤어](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4/가정식책방-202403.JPG-590px-500x383.jpg)
![[가정식 책방] 서점원Q가 보내는 11월의 편지](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12/가정식책방-202311-02-590px-500x383.jpg)
![[가정식 책방] 작은 일렁임이 파도가 될 때까지](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11/202310-630px-500x383.jpg)
![[가정식 책방] 오늘은 대목](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10/11-630px-500x383.jpg)
![[가정식 책방] 밤과 밤](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09/밤껍질-680px-500x3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