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한샘
큰 명절이다.*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민족 대이동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 이미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영화가 나오는 화면을 틀어놓고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한 채 무료한 연휴를 보내지 않으려나.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명절 당일만 쉬고 명절 다음날에는 문을 열어야겠다. 요즘은 세배도 원격으로 하고, 세뱃돈도 온라인 송금으로 받는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 넉넉해진 마음으로 책방에 와서 책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심심한데 책방이나 갈까? 보내주신 용돈으로 책을 사는 게 어떠니? 거 참 책 사서 읽기 좋은 날이군. 같은 다정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웃으며 들어오는 인파로 16평 책방은 미어터질 것이다. 그야말로 대목, 대목이다.
나는 나의 상상에 번번이 속는다. 없던 돈이 생겼다고 사람들이 책을 사러 오지는 않아. 내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지만 귀를 막아버린다. 그동안의 데이터에 기반해 꽤 정확한 예측을 한 목소리를 악의 소리라 단정 짓고 외면한 대가로 아무도 오지 않는 책방에서 혼자 보내는 하루를 얻는다. 난방비가 아까워 난로도 틀지 않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처량한 모습으로 오들오들 떨면서 책을 읽는 멍청한 서점원. 그게 나다.
혼자 듣고 있자니 더욱 슬퍼지는 느릿한 음악이 책방을 채운다. 시린 발을 비비며 그 와중에 조금 졸기도 하며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자니 좀 억울해진다. 이제 두 시간 남았는데 그 안에 누가 올까.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까지 고파온다. 담요를 접어 차가워진 무릎에 올리며 생각한다. 오늘 문을 연다고 쓴 공지 글을 아무도 읽지 못한 것일까? 저 멀리 스코틀랜드의 중고 서점 운영자인 숀 비텔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문을 연 날, 그런 의문을 가졌었다.
맥이 빠질 정도로 한산한 날이었다. 아마 이 지역 방문객들이 우리가 문을 안 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_숀 비텔, 《서점 일기》, 김마림 옮김, 여름언덕
하지만 이어지는 기록에 저 날 저 서점을 찾은 손님은 열네 명이었다고 적혀 있었다. 열네 명이라니! 내 책방의 일주일 손님을 다 합해도 될까 말까 한 숫자이다. 방문객이 있는 동네에 위치한 것도 아니요, 함께 일하는 동료도 없는 나는 스코틀랜드 서점 주인의 엄살에 코웃음을 친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조기 퇴근의 유혹과 싸우며 마감을 한 시간 남겨두었을 때 손님 한 명을 맞이한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 귀인은 누구일까.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 바이러스로 인해 도래한 마스크 세상은 원래도 얼굴을 잘 못 알아보는 나를 더 큰 혼란에 빠뜨렸다. 오늘 처음 오셨죠? 해맑게 묻다가 어엇, 요즘은 다들 마스크를 쓰시다 보니 제가 잘 못 알아봐요, 라며 변명하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그 질문조차 안 하게 된 지가 오래다. 종일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아 잠겨 있던 목소리로 겨우 짧은 인사를 건네고 서둘러 난로를 켠다. 연휴에 에코백 하나만 들고 홀로 책방을 찾아오신 분. 음식 냄새와 티브이 소리에 질려 나 잠시 나갔다 올게, 하며 지갑과 핸드폰만 들고 탈출하신 것은 아닐까. 아니, 그러고 싶었던 사람은 나였다.
나는 그랬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다. 스무 명의 국그릇과 밥그릇, 반찬이 묻은 접시와 수저가 담긴 설거지통이 나를 덮치지 않는 곳으로 빠져나가고 싶었다. 나를 빼놓은 그들의 웃음소리와 의미 없는 티브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가고 싶은 여러 번의 명절이 있었다. 그렇게 뛰쳐나가서 도착하고픈 곳은 어디였을까. 이런 책방은 아니었을까. 지금 책방을 찾은 손님은 지난날의 내가 아니지만, 나는 그때의 내게 필요했던 것들을 드리고 싶어진다. 그러면 뛰쳐나가지 못했던 과거의 나도 조금 괜찮아질 것만 같다.
함께 있는 온기는 느껴지되 철저히 혼자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다.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은밀한 움직임으로 스피커 쪽 서가로 가시면 볼륨을 약간 줄이고 어두운 쪽 서가로 가시면 전구의 밝기를 조절한다. 나는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며 과거의 나와 지금의 손님을 살핀다.

책에 집중한 손님과, 손님의 발길에 집중한 나 사이의 시간이 훌쩍 흐른다. 정확하게 마감 5분 전이 되니 고른 책을 카운터에 내려놓으시고, 나는 책들을 보고 이 손님이 처음 오신 분임을 확신한다. 이탈로 칼비노와 엘리자베스 문을 함께 사 가시는 분을 내가 기억하지 못할 리 없다. 책에 띠지를 두르며 참지 못하고 물어보고야 만다. 가까이서 오셨나요, 아니라고요 그럼 어디서… 아, 그럼 운전해서 오셨나요.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오셨다고요. 아우 잘 오셨어요… 끝나는 시간을 미리 보고 오셨다는 손님은 카드를 돌려받으며 오늘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꼭 와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한 후 책을 받아 들고 서둘러 나가신다. 그 말은 나의 오늘을 대목으로 만들어준다.
사람들이 많이 올 거란 상상은 애초에 아무런 근거 없이 오로지 나의 강렬한 바람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니 다음 명절에 또 문을 연다고 해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일이 생길 확률은 매우 희박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음에도 기꺼이 이 상상에 속으려 한다. 현재의 누군가를 통해 과거의 나를 만나기 위해.
─✲─
정한샘
2020년 7월 31일 가정식 책방 ‘리브레리아Q’를 열었다. 이탈리아에서 음악을 공부했고, 지금은 책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딸과 나눈 책 편지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는 마주 앉아》를 썼고, 그림책 《구름의 나날》을 옮겼다.
_리브레리아Q @libreriaq


‘가정식 책방: 리브레리아Q 서점원 노트’는 [월간소묘 : 레터]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가정식 책방: 리브레리아Q 서점원 노트]
여긴 뭐하는 곳인가요? • 기다리는 일 • 밤과 밤 • 오늘은 대목 • 작은 일렁임이 파도가 될 때까지 • 서점원Q가 보내는 11월의 편지 • 보이지 않는 곳에서 • 기뻤어, 기뻤어, 기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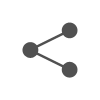
![[가정식 책방] 기뻤어, 기뻤어, 기뻤어](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4/가정식책방-202403.JPG-590px-500x383.jpg)
![[가정식 책방] 보이지 않는 곳에서](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1/202312-가정식책방-그림-연극소프루의-한-장면-_국립극장.jpg-580px-500x383.jpeg)
![[가정식 책방] 서점원Q가 보내는 11월의 편지](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12/가정식책방-202311-02-590px-500x383.jpg)
![[가정식 책방] 작은 일렁임이 파도가 될 때까지](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11/202310-630px-500x383.jpg)
![[가정식 책방] 밤과 밤](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09/밤껍질-680px-500x3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