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한샘
출근하기 싫은 날이 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삶이 아닌, 책이라는 물건을 파는 삶이 나를 온통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아침이 가끔 찾아온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곳으로 들어가 내 정신이 수용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선 책들을 상대하는 매일의 삶이 갑자기 버겁게 느껴지는 날. 그런 날이면 책방을 하겠다는 사람은 말리고 싶다던 수많은 책방 선배님들의 글과 말이 손에 손을 잡고 나를 감싸고 돌며 강강술래를 한다. 정신이 혼미해지도록 빙글빙글 도는 그 원을 간신히 끊고 기어 나와 나의 작고 노란 책방의 문을 여는 일이 고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 있다.
책방으로 가는 길 신호 대기 중에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를 보았다. 노란색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고 고인 물에 발을 넣었다 뺐다 하기에 눈길이 갔다. 우산은 펴지 않고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비를 맞으며 놀고 있기에 그림책에서 방금 튀어나온 모습 같네 하며 바라보는데 아이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을 춤이라고 해도 될까. 가만히 보자니 아, 저것은 웨이브다. 보고 있던 나는 너무 당황했는데 아이도, 아이의 가방을 들고 있는 보호자도 평온해 보였다.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음악도 없는 그 거리에서 무아지경으로 꿀렁꿀렁 몸을 흔드는 노란 우비의 아이와, 고요히 바라보는 보호자. 그 광경이 놀라운 건 나뿐인 듯했다. 신호가 바뀌고 비보호 좌회전으로 책방 거리에 들어설 때까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메모장에 “놀라운 아이를 보았다. 노란 우비를 입고 긴 우산을 손에 든 채 비를 맞으며 웨이브를 추고 있었다”라고 적었다.
잘 우러난 차를 투명한 주전자에 담아 워머 위에 올려두며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내어드릴 차가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날씨에는 커피보다는 차가 좋은데 하는 생각을 한다. 차가 부족할 만큼 손님이 밀려드는 상상을 하면 너무 좋고, 좋은 만큼 피곤해진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자동으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의 인사에 들어오는 사람의 반 정도가 대답을 한다. (눈을 마주치는 것도 대답으로 친다) 나머지는 마치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는 듯 내 목소리의 방향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한 채 들어오는데, 그저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란 걸 몰랐을 때에는 내 목소리가 작아 못 들은 건가 싶어 소리치듯 인사를 건네기도 했었다.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책을 사지 않는다. 책을 사지 않는 사람들이 서가를 둘러보는 모습은 참 닮아 있다. 책을 들어서 살펴보지 않고, 선 자리에서 내려다본다. 그중에서도 팔짱을 끼고 서가를 도는 사람들은 진짜다. 진짜로 책을 안 살 작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책을 안 사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바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가를 돌아보는 사람들이다. 한번 주머니에 들어간 손은 책방 문을 나설 때에야 다시 나온다. 책을 집어 들기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책을 살 리 없다는 건 당연해 보인다.
그런 방문이 계속되면 나는 슬퍼진다. 사람들이 책을 사지 않아서,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가 그 안에 들어 있다. 책을 사지 않고 나갔을 뿐인데 내가 골라놓은 책이 외면받는 기분이 든다. 선택받지 못한 책들은 외로워 보이기만 한다. 책방의 하루는 그저 낭만만 가득할 거라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 밖에서 보이던 그 노란 책방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나는 영영 모를 텐데도 내 마음대로 따뜻한 공간이라 생각해 버린 건 아니었을까. 끊지 못한 생각들이 이어지면 다시 말들이 주위를 돌기 시작한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책 좋아하면 책방 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책을 파는 일은 결국 다른 세계에서 오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책방으로 출근하는 것은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는 일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도 여전히 어색한 일이어서 나는 이 일을 오래 하고 싶기도 하고, 당장 그만두고 싶기도 하다. 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실망하고, 왔으나 책을 사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슬플 때면 음악도 없이 꿀렁꿀렁 몸을 움직이던 아이를 생각한다. 우산이 있지만 우비에 달린 모자 위로 떨어지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온몸을 둥글게 둥글게 만들던 아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 움직임. 내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몸 대신 마음을 둥글게 둥글게 만들어본다.
글 쓰는 데 고통을 받던 버지니아 울프는 좋은 날 다음은 나쁜 날, 그렇게 지나간다고 했다.* 그리하여 나도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있지만 계속 책방 문을 연다. 지나가는 하루하루 안에서 타인의 글을 팔기 위해 나의 글을 쓴다. 책이 사람을 불러오리라는 믿음으로 쓴다. 차를 데우던 초가 꺼지기 전에 문이 열리고 얼굴이 들어온다. 일주일에 세 번은 보는 얼굴. 어디에 원하는 책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발걸음은 새로 들어온 책을 정리하기 전에 두는 비밀 장소로 향하고, 나는 그 발걸음을 안도의 눈으로 뒤쫓는다. 새로 들어온 책등을 정성스럽게 훑는 손길을 보며 오늘의 첫 손님이 마지막 손님이 되더라도 책이 연결해 주는 마음을 믿어보고 싶어진다. 오늘도 책방 문을 열었으므로 오늘의 손님, 미지의 세계로 들어와 단골이 되어준 손님과 마주한다.
*버지니아 울프 <울프 일기> 1936년 6월 23일
─✲─
정한샘
2020년 7월 31일 가정식 책방 ‘리브레리아Q’를 열었다. 이탈리아에서 음악을 공부했고, 지금은 책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딸과 나눈 책 편지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는 마주 앉아》를 썼고, 그림책 《구름의 나날》을 옮겼다.
_리브레리아Q @libreriaq


‘가정식 책방: 리브레리아Q 서점원 노트’는 [월간소묘 : 레터]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가정식 책방: 리브레리아Q 서점원 노트]
여긴 뭐하는 곳인가요? • 기다리는 일 • 밤과 밤 • 오늘은 대목 • 작은 일렁임이 파도가 될 때까지 • 서점원Q가 보내는 11월의 편지 • 보이지 않는 곳에서 • 기뻤어, 기뻤어, 기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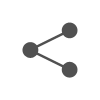
![[가정식 책방] 기뻤어, 기뻤어, 기뻤어](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4/가정식책방-202403.JPG-590px-500x383.jpg)
![[가정식 책방] 보이지 않는 곳에서](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4/01/202312-가정식책방-그림-연극소프루의-한-장면-_국립극장.jpg-580px-500x383.jpeg)
![[가정식 책방] 서점원Q가 보내는 11월의 편지](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12/가정식책방-202311-02-590px-500x383.jpg)
![[가정식 책방] 작은 일렁임이 파도가 될 때까지](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11/202310-630px-500x383.jpg)
![[가정식 책방] 오늘은 대목](https://sewmew.co.kr/wp-content/uploads/2023/10/11-630px-500x383.jpg)